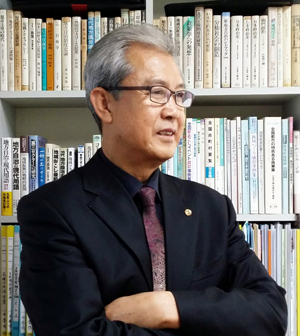
"농경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우리 전통문화는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놀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신문 연재소설이었던 김주영 작가의 '객주'에서 모티브를 잡아 '보부상 이야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5일장을 장악했던 행상으로 짐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 등짐장수인 '부상'과 짐을 보자기에 싸서 팔러 다니던 봇짐장수인 '보상'을 합한 '보부상'은 국가관과 결속력이 탄탄했고 삶의 희로애락도 남달랐던 민초들의 직업군이었다.
한울북춤연구원장으로 35년째 전통문화의 부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황보 영(62) 씨는 이 점에 착안, 2년간의 자료준비와 노력을 통해 보부상들의 난전놀이를 북춤 마당극으로 재현한 마당놀이 '보부상 이야기' 기획 및 총감독을 맡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13~15일 오후 7시 각 한 차례씩 3번의 공연(전석 2만원)을 갖는다.
"이야기와 창가 형식으로 꾸민 마당놀이는 대구의 재주꾼 20명이 등장해 해학과 풍자로 관객과 함께 배꼽을 잡고 한번 흐드러지게 웃겨 볼 작정입니다."
'보부상 이야기'는 팔도를 유랑하는 소금장수를 주인공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회자하는 남녀상열지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식으로 펼쳐진다. 특히 보부상들의 직업적인 특성상 1년에 기껏 한 차례 집에 들르다 보니 한날한시에 태어나게 된 등장인물 정비슬, 우비슬, 허비슬의 탄생 배경도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보부상은 시장의 지킴이 역할을 했고 시장은 유행의 풍조와 오락의 장을 여는 난장으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또 시장은 민중의 요구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가장 민감한 현장이었고 저잣거리는 민속의 귀중한 창고이며 역사가 생동하는 고향이었던 거죠. 기우제와 별신굿 형태도 여기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부상은 엄격한 직업적 윤리가 확고했다. 신분증인 '험표' 뒤에는 '망언하지 말 것' '행패 부리지 말 것' '음란해서는 안 될 것'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4가지 계명이 있었고 이를 어길 때는 멍석말이를 했는데 이때는 관아에서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부상이 쓰는 패랭이(갓) 양쪽에 붙인 두 개의 솜뭉치에도 나름의 기능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부상임을 알리는 표식이었으며, 둘째 임진왜란 같은 국난이 닥쳤을 때 관군의 통신병 역할을 하며 갈증을 해소하고 숨을 고르기 위해 이것을 물에 적셔 입에 물었으며, 셋째 관군이 사용하는 화승총 발사를 위해 유사시 솜뭉치에 화약을 묻혀 사용하기도 했다.
'가노 가노 언제 가노/열두 고개 언제 가노/시그라이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 가노/주인 주인 문여소/보부상 행렬 들어갑니다'
황보 씨는 "삶의 고단함과 애환이 깊게 서려 있는 이 가사를 듣다 보면 누구라도 우리 민족 공유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신명에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애석하게 여겨 전통문화의 부활을 위해 '제1회 가자 아라리아'를 기획, 6차례 공연한 바 있다. 이번 '보부상 이야기'는 '가자 아라리아'의 2탄인 셈이다.
우문기 기자 pody2@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