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덕왕릉에 다시 가 보고 싶었다. 오래전 처음 그곳에 갔을 때가 어느 이른 봄날이었다. 마치 봄에 아기를 낳은 산모가 봄만 되면 산후 후유증을 앓는 것과 비슷한 증상처럼, 이맘때만 되면 그곳에 가고 싶어진다.
어느 사진작가의 사진에서 본 새벽 안개에 싸인 그 신비로운 소나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그 왕릉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낀 후부터 자주 생각 나곤 했다. 오후 5시, 능을 보기엔 참 좋은 시각이었다. 늦은 햇살이 무거운 소나무 숲에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 능을 지켜온 숲은 마치 순장 묘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 같았다. 숲이 뭔가를 꽉 잠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떠받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선뜻 들어서기가 망설여졌다.
저들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제 몸을 비틀어 날아가려는 큰 새의 형상을 떠올리기도 해, 누군가 발을 디디면 홀연히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홀린 듯 서 있었는데 서로 엉킨 듯 서 있는 소나무의 묘한 선들이 어둑하고 음산한 숲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능은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동성로에서 빽빽한 인파를 다 헤집고 나서야 멀리 서 있는 당신을 만날 수 있었듯이 숲은 은밀히 능을 숨겨두고 있었다.
부인을 잃은 왕의 외로움이 오롯이 서려 있는 무덤을 둘러볼 동안 인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왕의 지극한 사랑으로 결국 부인과 함께 합장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달리 마치 여기가 어둠의 시작점인 것처럼 어둠이 날개를 퍼덕거려 숲과 능을 곧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무덤을 몇 바퀴 돌아 나오는 길엔 유리 조각처럼 깨진 붉은 저녁 빛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는데, 숲은 그 빛을 다 삼키지 못해 짙은 각혈을 뱉어 내는 듯했다. 그것은 몹시 번득거려 왠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릴 진실처럼 애잔했다. 지난밤 나는 나에게 많은 투정을 쏟아냈다.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조각이었을 텐데 그 조각들을 다시 삼켜내느라 뒷목덜미에 붉은 자국들이 찍혀져 있음을 여기까지 와서야 알았다.
어두운 숲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소나무들 곁에서 '당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 편을 들어라'라는 카프카의 말이 카메라 플래시처럼 짧게 머물다 사라지자 숲은 좀 더 어두워졌다. 어두워져야 더 잘 보이는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 내가 만든 덫을 내 발이 밟는 일이 잦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일까. 삶에서 뚝 떨어져 나온 듯한 이 숲에서 나가기가 두려웠지만, 어둑한 정적과 이 서늘함이 능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숲이 나를 돌려보내고 있었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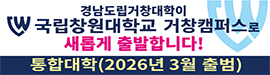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