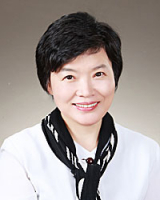
청년들의 인디문화 야성 살도록
어른들의 애정어린 관심 보여서
청년유출 막아야지 대구 살아나
지난 토요일(21일), 주말마다 록(rock) 공연을 여는 대구 대명동 '대명문화의 거리' 길 건너편에 있는 클럽 '헤비'(HEAVY)에 갔다. '그래 나는 아직 대구에서 록 한다'(Still Get The Rock In Daegu)를 웹 포스터에 내건 록밴드 래디오의 3집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축하해줄 겸, 인디문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해서였다.
그날 공연에는 6인조 엉클스가 래디오 밴드와 같이 공연했고, 결성 3년 차 밴드 로스팅스카(roasting's car)도 게스트로 초청되었다. 공연 직전에 도착해서 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1996년부터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클럽 헤비를 이끌고 있는 대구 인디문화의 대모(代母)가 입장권을 팔고 있다. 1만원을 내고 받은 입장표에 '2'가 쓰인 것으로 봐서 나는 두 번째 유료 청중이었다.
공연 성과는 논외로 치고, 이날 입장권 판매 수입은 14만원. 이를 공연팀 13명과 클럽 헤비가 나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인디문화에 빠져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존심으로 버텨나간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클럽 헤비는 20년 동안 대구 인디 문화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 헤비는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순수 공연장으로 공연 기록만 수천 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난한 청년들의 성지(聖地)이다.
이번에 록 공연을 간 것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찾았던 인디밴드 포럼의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대구'부산'대전 등지 인디문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미래비전을 가감 없이 털어놓는 인디포럼에 '청년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는 대구시나 구청 혹은 문화기관의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기성세대가 대구의 청년 인디문화를 백안시하는 현장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찾은 워싱턴 DC의 하드록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워싱턴 DC의 하드록카페는 청춘 남녀들이 잃어버린 꿈과 사랑을 찾아서 무한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하드록카페를 낳은 산실답게 열기로 뜨거웠다. 록 공연을 테마로 먹을 거리'볼거리'관광상품까지 연계하여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당긴다. 문화가 돈이 되는 현장이다.
미국이나 홍대라는 특화된 시장을 가진 서울과 비교하지 말자. 그냥 엇비슷한 부산이나 대전과 견주어봐도 인디문화를 지향하는 대구 청년들은 힘들다. 부산시는 '청년문화의 수도'를 지향하며 지난해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한발 앞서나갔다. 대전도 순수 민간의 힘으로 인디문화 전용 공간을 신설한 데 이어, 500석짜리 공연장을 매진시킬 정도로 인디밴드 공연에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변화가 필요하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9일 밝힌 2014 인구이동에서 대구는 지난 1995년 이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인구가 줄고 있고, 올해 역시 인구 유출이 많은 도시로 낙인 찍혔다. 그것도 30대, 20대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구가 청년유출을 막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일자리만 따졌지만, 이제는 문화도 젊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와 혁신의 에너지는 도시외곽(즉 공장 부지)이 아니라 도심 내부(사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도시의 창조와 혁신에너지는 청년들을 불러들인다. 대구경북에서는 매년 800여 명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들의 야성을 지켜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결성된 대구시청년위원회를 시작으로 대구문화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더해질 때 역외 청춘들이 대구로 모여들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하자.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