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의 문중 이야기에서 다룰 세 번째 문중은 성산 여씨(星山呂*氏) [*한자 관련=성산 여씨 문중에서는 呂자를 입구(口)자 두 개 사이에 선을 빼고 사용합니다] 문중이다. 대다수 문중이 시조나 중시조의 묘소와 관련한 명당 이야기가 전해 오지만 김천의 성산 여씨 문중은 중시조와 입향조를 비롯한 명당이야기가 세 가지나 전해온다.
후손들이 입을 모아 성산 여씨의 오늘이 만들어지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하는 신기한 묫자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금까마귀가 시체를 쪼다
성산 여씨는 중국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을 피해 신라로 귀화한 여어매(呂禦侮**)[**한자 관련='모'라고 읽지 않고 '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를 원조로 삼고 있다. 김천의 성산 여씨 문중은 고려말 왜적을 물리친 공적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랐던 대광공(大匡公) 여양유(呂良裕)를 중시조로 한다.
성산 여씨 문중에 전해오는 첫 명당 전설은 여양유의 묘와 관련이 있다. 여양유의 묘는 지금의 구미시 광평동 박정희체육관 뒤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박정희 체육관 후문을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자리한 여양유의 묘를 만날 수 있다. 여양유의 묫자리는 금오탁시형(金烏啄屍形)의 명당으로 성산 여씨 문중에서는 전국 8대 명당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금오탁시의 의미는 금까마귀가 시체를 쪼는 형상이라고 해석된다. 뜻만으로는 과연 명당이 될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성산 여씨 문중의 해석은 좀 다르다. 금오탁시 명당 아래로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선산(先山)이 있었는데 전주 이씨가 이곳에 묘소를 쓰면 그 당대에 성산 여씨 문중에서 큰 인물이 났거나 부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전주 이씨 문중의 묘가 금오(금까마귀)의 밥이 되어 발복(發福)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동안 전주 이씨 문중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묘를 계속 써 왔고 한때 약 50여 기에 달하기도 했으나 박정희체육관이 들어서며 어느 순간 이곳에 있던 묘를 모두 이장해 갔다고 한다.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 귓등으로 흘려 듣기에는 신비할 따름이다.
◆친구에게 옥녀산발형의 명당을 양보받다
성산 여씨 문중 후손 중 김천 입향조로 알려진 여종호(呂從濩)와 그의 부친 여희망(呂希望)과 관련한 명당이야기도 신비하기 그지없다.
성산 여씨가 김천으로 입향한 시조는 알려진 바대로 여종호다. 여종호는 12세에 현 성산 여씨가 터전을 잡은 기를마을(한자로는 耆月이라고 쓰이지만 발음이 어려운 탓에 기를이라 불린다)의 천석꾼 부자인 인천 이씨 가문으로 장가를 들었고 이후 김천에 정착했다.
당시 인천 이씨 가문에서는 사위를 구하고자 전국에 사람을 풀었다. 이 와중에 성산 여씨 문중의 여종호가 사위로 선택됐는데 그 이유가 여종호의 아버지 여희망이 생전에 꾀를 내 천하의 명당을 묫자리로 잡아둔 덕택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여종호의 아버지는 성주 봉학동(달창)에 살았다. 그에게는 이 진사(進士)로 불리던 성산 이씨 친구가 있었는데 당대를 대표하는 풍수지리의 대가였다. 친구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여희망은 이 진사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묫자리를 잡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진사는 성주 봉학동의 한 저수지 앞에 있는 산자락에 묫자리를 잡아주며 이곳이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선녀가 머리를 풀어헤친 모양)의 명당이라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여희망은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그곳을 사후 묫자리로 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풍수가로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친구 이 진사가 자신의 묫자리는 어디로 선택했을지 궁금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진사의 행동을 살피던 여희망은 이 진사가 개울을 건너 자신의 묫자리를 잡아 주고는 개울 옆길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 냈다.
이 진사의 이런 행동을 기이하게 여긴 여희망은 이 진사가 들어갔던 산속으로 길을 더듬어 갔고 그곳에서 지관들이 사용하던 나침반을 둔 흔적을 발견했다.
풍수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여희망은 단박에 그곳이 천하의 명당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친구의 묫자리로 정한 곳을 내 달라고 하려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명당자리는 탐이 나기에 꾀를 냈다.
여종호의 아버지 여희망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어 상여를 운반하게 되면 개울을 건너지 말고 곡을 하고 있으라고 일렀다. 기다리고 있으면 풍수가였던 이 진사가 찾아올 터이니 연유를 물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라고 당부했다.
여종호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사전에 자리 잡은 묫자리로 상여를 이고 가다가 개울 앞에서 멈추고 곡을 계속했다. 친구의 죽음에 상여를 따라나섰던 이 진사는 여종호 형제에게 곡을 하는 연유를 물었고 이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진사는 "허허 명당의 주인은 따로 있었구먼" 하며 자신이 잡았던 묫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여종호는 명당의 기운을 받아 김천의 갑부인 인천 이씨 가문으로 장가를 들었고 그 부를 물려받아 성산 여씨 문중의 김천 입향조가 됐다는 이야기다.
◆목마른 꿩을 위해 우물과 먹이를 준비한 지혜
마지막 명당 전설은 김천 입향조 여종호와 그 아들 송오(松塢) 여응구(呂應龜'1523~1577), 손자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1552~1619)의 무덤과 관련한 이야기다. 구성면 송죽리에 있는 이들의 무덤은 꿩이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형국이라는 갈치음수형(渴雉飮水形)의 명당이라고 전한다.
덕대산 자락을 따라 내려오며 이들 3대의 무덤이 있는 곳은 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산세는 무덤을 지나 감천 방향으로 뾰족이 흘러내리는데 이곳이 꿩의 부리라는 해석이다.
이 꿩의 부리 옆에는 성산 여씨 문중이 세운 어매재(禦侮齋)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 옆에는 자그마한 웅덩이가 존재한다.
이 웅덩이는 목마른 꿩에게 물을 공급해 이 자리를 명당으로 만들기 위해 팠다고 전한다. 여종호는 꿩은 물을 많이 먹지 않기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라고 후손들에게 전했고 후손들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도 이 웅덩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더불어 꿩의 부리에 해당하는 산자락 아래에는 작은 바위들을 곳곳에 놓아뒀다. 이 바위들은 꿩의 먹이인 콩이라는 의미로 목마른 꿩이 물과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 후손들의 발복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공동기획 김천시 (김천시 마크 넣어주세요)
김천시사
김천 종가문화의 전승과 현장(민속원)
디지털김천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여옥달 성산 여씨 김산 중파 감호공 12세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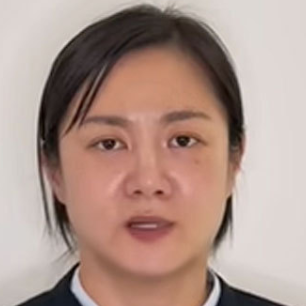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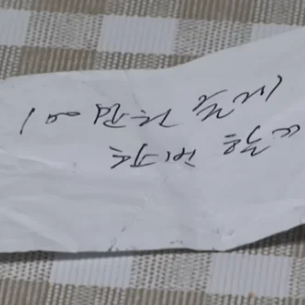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