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알려져 있다. 왕비가 죽은 뒤 맞이한 화희와 치희 두 여인이 서로 다툰 끝에 한족(漢族)인 치희가 떠나버리자, 암수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에 빗대어 이별의 정념을 노래한 것이다. 고려가요 '가시리'가 이별의 슬픔을 보다 솔직하게 드러낸 속요의 성격을 지녔다면, 정지상의 '송인'(送人)은 지식인이 남긴 대표적인 송별시이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시리잇고'로 시작하는 '가시리'나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태는 것을'(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로 끝나는 '송인'이나, 이별의 아픔을 곡진하게 표현하면서도 자기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담고 있다. 이른바 이별에 관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라고도 할 수 있는 '승화된 정한(情恨)'이다.
이 같은 이별의 정한은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는 조선시대 황진이의 시조 등으로 맥락을 이어가며, 판소리 사설의 이별 장면이나 민요 '아리랑'을 통해 보다 서민적인 감정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별의 정서는 김소월과 한용운이라는 걸출한 시인이 등장하면서 그 최고봉을 이룬다. 김소월은 '진달래꽃'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란 반어미학(反語美學)을 통해 이별에 관한 정서적 순화의 극치를 이룬다. 불교 시인 한용운은 '이별은 미(美)의 창조'라는 시적 선언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이르는 이별 미학을 창출했다.
그것은 현대의 가곡 '그집앞' '바위고개' 등은 물론 대중가요의 애절한 가사를 통해서도 이별의 서러움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순화 정서로 나타나는 것이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다. 만남이란 그 자체가 이별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계절이 왔다가 가고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만남과 이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연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속칭 '이별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집착이나 스토킹에서 폭행'협박'감금에 이르는 속칭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사랑의 깊이만큼 이별의 아픔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성숙한 이별도 필요한 것이다. 이별에도 격조가 있다. 막 되먹은 사람들의 싸구려 만남에서 무슨 이별의 정한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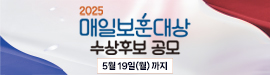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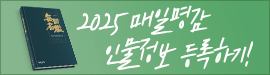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