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은 재벌 총수 유무에 따라 구분
총수가 경영권 행사 땐 사회 감시 필요
CEO 체제는 낙하산·관피아 문제 불거져
상임감사제 통해 '눈먼 돈' 최소화해야
방송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 그룹, 재벌, 대기업, 공기업 등 여러 형태로 기업이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87년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했고, 이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 지급보증 금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전경련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제도를 도입한 1987년에는 자산 규모 4천억원 이상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1992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가 78개로 불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 재계 자산 순위 30위로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재계 순위가 빈번히 바뀌는 현실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61곳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으로 구분을 짓고자 한다. 요즘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과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어긋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그룹, 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상속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등은 전자에 속한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재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경유착 비리의 포스코, 경영자의 자격 미달로 만신창이가 된 STX조선, 자회사 M&A 비리가 불거진 KT&G 등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는 주로 공기업에서 출발하여 민영화된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경영권은 주주총회를 장악한 재벌 총수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하지만 순환출자라는 고리로 전체 기업 지분에서 총수의 지분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2.24%,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1.89%,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0.05%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나 대한항공 재벌 자녀의 황제 갑질 횡포로 인해 국민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8월 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 총수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하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군은 아주 미미한 지분을 통해 총수가 거의 100%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제3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몇몇 국책기관들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영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낙하산,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의 경우, 문제의 핵심은 주주나 채권단(기업주체)과 경영자(대리인)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총수가 없는 대기업군에 '상임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상임감사를 통해 경영자에 대해 건전한 견제 세력을 형성하게 해 흔히 이야기하는 '눈먼 돈'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KT&G이다. 전임 사장이 비자금 의혹으로 사표를 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KT&G와 지배구조가 유사한 포스코는 내부 전문경영인 출신의 권오준 회장을 택했고, 정경유착의 불씨로 작용한 M&A를 통한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으로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STX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조선해양에서 잔뼈가 굵은 정성립 사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으로 빠르게 정상화를 되찾았다.
KT&G는 현재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과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지금껏 내부 승진을 통해 최고 경영진이 선출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 KT&G의 차기 CEO는 내부의 경영전문인을 통해 지금의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CEO 선출에 있어서도 총수가 없는 대기업의 경영권은 내부의 전문경영인이 맡는다는 기존의 원칙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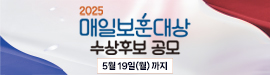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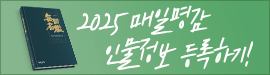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