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영화배우 시절 53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나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던지 수입이 500만달러를 넘는 해도 있었다. 하지만, 레이건은 수입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가 영화배우로 입문한 1937년 미국의 소득세율은 79%였고, 1943년에는 정부가 2차 대전 전비 조달을 위해 세율을 더 높이면서 94%로 치솟았다.
이런 고세율은 그에게 '세금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이 고율 소득세 구간에 도달하자 영화 출연 제의도 거절하게 됐다. 1만달러를 받아 600달러만 남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나도 마찬가지였다. 전후 할리우드의 유행이 레이건처럼 말쑥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에서 윌리엄 홀든처럼 강인한 영웅 이미지의 배우로 바뀌었다. 영화 출연은 뜸해졌고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금은 큰돈을 벌던 때에 못지않았다. 재정 상태가 붕괴할 지경에 몰린 레이건은 "세금은 필요악을 넘어 순전한 악이며, 낭비와 의존을 부추겨 부패한 시스템을 조장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케인스 하이에크' 니컬러스 웝숏)
레이건 대통령이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시행한 배경에는 이런 개인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국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감세 정책이 기대했던 경제성장보다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은 것을 보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는 힘들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에는 박 대통령의 여론조사 트라우마와 김 대표의 낙천(落薦)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선거인단 투표는 이기고도 여론조사에서 뒤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졌다. 김 대표는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이계의 공천 학살에 낙천했고,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탈박(脫朴)에 대한 친박의 역공으로 낙천했다. 이런 경험이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각각 '안심번호'와 전략 공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공적(公的) 사안이 개인적 경험에 좌우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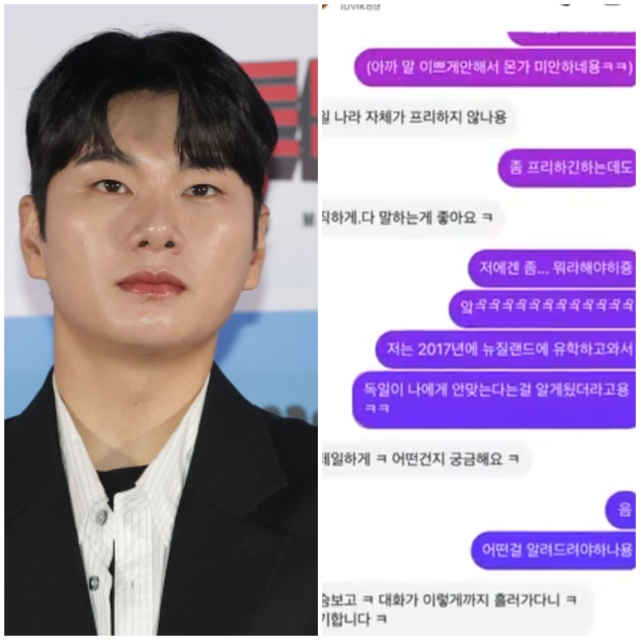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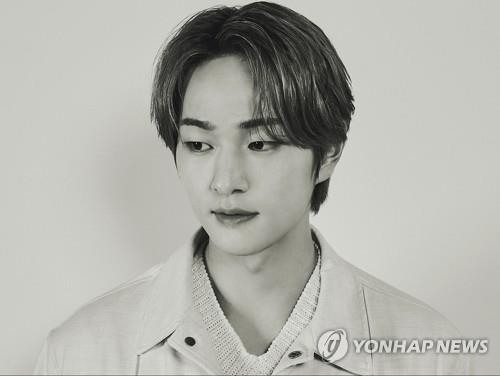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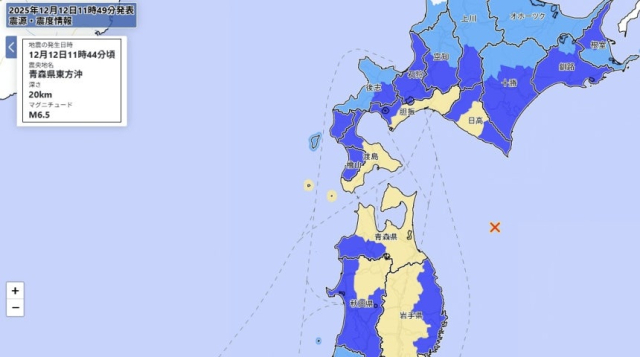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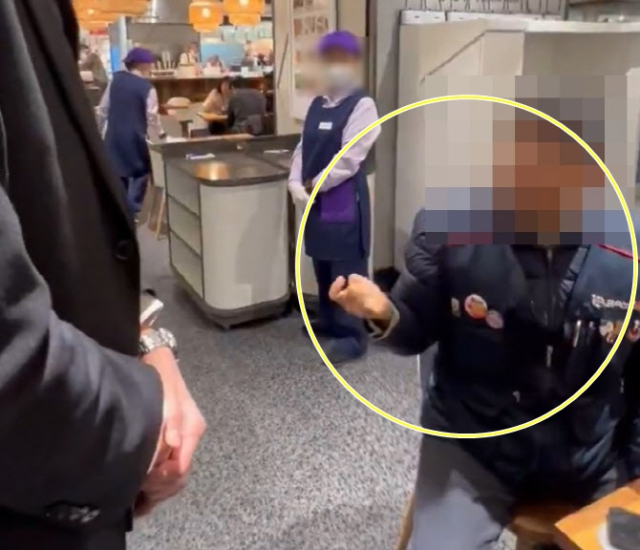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