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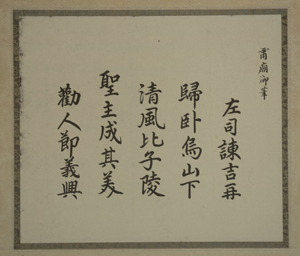


야은 길재의 초상화를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 오른쪽 귀가 보이지 않는다. 보통 정면을 응시한 모습을 나타낸 초상화와 다르게 조금 특이한 구도의 그림인데 해평 길씨 문중 사람들 사이에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낙향한 길재가 새 왕조를 섬기지 않은 죄를 묻고 고려 왕조에 대한 그의 충절을 떠보려고 관리를 보내 그의 목을 베어오라 지시했다. 길재가 순순히 목을 내밀면 목 대신 귀 한쪽만 자르고 목을 움츠리면 목을 베라는 것이었다. 어명을 받은 길재가 순순히 목을 내밀자 집행관은 귀 한쪽만 베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태조는 길재의 흔들리지 않는 충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길재의 초상화에 한쪽 귀가 나타나지 않은 연유가 담긴 이야기이다. 정사(正史)가 아니라 야사(野史)이지만, 후손들은 길재의 충절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길재는 1390년에 벼슬을 사직한 후 고향 구미로 돌아왔다. 길재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2년 뒤 고려 왕조가 멸망하자 고려 유신 72명이 새 왕조를 거부하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마을로 은거했다. 이들이 마을의 동'서쪽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고서 문밖으로 나가지 않자 조선 왕조는 군사들을 보내 이들을 불살라 죽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지명이 유래해 이 마을은 두문동(杜門洞)이라 불렸고 이들은 '두문 칠십이현'이라 일컬어졌다. '두문불출'(杜門不出)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두문동이라는 지명은 다른 여러 곳에도 남아있다. 개성 부근 보봉산 북쪽에도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다. 고려 왕조에 충절을 다짐한 장수 48명이 들어와서 몸을 씻고서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한 골짜기라고 한다. 이들의 이름 역시 전하지 않으며 세신정(洗身井), 회맹대(會盟臺)라는 지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구미로 돌아온 길재는 옛집이 아니라 금오산 산중 마을인 대혈동(大穴洞)에 들어가 부인과 2남 3녀의 가족들과 함께 은거했다. 대혈동은 197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금오산성 내성 안의 성안 마을보다 더 위쪽에 있었다. 성안 마을은 해발 976m 금오산의 8부 능선인 해발 800m 지점에 있던 마을로 대혈동은 그보다 위쪽에 있었으니 금오산 정상에 더 가까웠다. 길재는 야은 이라는 호 외에 금오산인(金烏山人)이라는 호도 갖고 있을 정도로 금오산을 좋아했고 중국 고대의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틀어박힌 것처럼 금오산 속에서 살았다. 길재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고자 조선 영조 44년(1768년)에 창건된 채미정(採薇亭) 부근이 길재가 살던 곳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그보다 금오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대혈동이 길재가 살던 곳이다. 채미정은 금오산 중턱 아래 주차장 건너편에 있으며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던 것처럼 길재도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는 의미로 붙인 명칭이다.
◆금오산 정상 가까운 대혈동에 숨어 살아
길재 집안의 살림은 궁핍했다. 워낙 청렴했던 데다가 몇 뙈기 전답이 있었으나 박토여서 벼농사 짓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노모까지 봉양해야 하니 고달픔은 더했다. 길재의 부인 신씨가 부유한 친정에 좀 의지할 요량으로 남편에게 친정이 있는 금주(충남 금산)로 옮겨가기를 청했으나 길재는 부모의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신씨가 남편 몰래 친정에서 식량을 얻어왔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달리 입에 풀칠할 방도가 없자 신씨는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들과 옷가지 등을 내다 팔아 음식을 장만하기도 했다.
노모에 대한 길재의 효성은 지극했다. 일설에 따르면 노모에게는 반드시 더운 밥과 반찬 차린 밥상을 올렸으며 새벽 문안과 잠자리를 챙기는 혼정신성(昏定晨省)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때로는 아침저녁 문안을 신씨와 아이들이 대신 하겠다고 자청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늙으셨으니 비록 뒷날 위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것"이라며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러나 고전문학 연구가이자 향토 사학자인 이택영 씨는 노모는 대혈동에서 산 것이 아니라 길재의 생가인 옛집에서 따로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길재가 매일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올리지는 못하고 틈나는 대로 찾아가 노모를 돌봤을 것으로 추정한다.
길재는 집에서 공부하거나 대혈동에 있는 대혈사에 자주 들러 주지 스님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또 동리 아래에 있는 야은굴(도선굴)에서 명상하거나 학문을 닦았다. 도선굴은 신라 말기의 스님이자 풍수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참선하여 득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오산 북서쪽 해발 약 480m의 사면에 위치한 자연동굴로 굴 내부의 길이는 7.2m, 높이 4.5m, 너비 4.8m이다. 암벽에 뚫려 있는 천연 동굴로 큰 구멍이라는 뜻의 대혈(大穴)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대혈동의 명칭도 이와 관련 있다. 그러나 이택영 씨는 도선굴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며 길재가 학문과 명상을 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전해지므로 도선굴보다는 야은굴이라는 명칭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1395년에 선산부사(군사'郡事) 정이오(1347년~1434년)가 길재가 궁핍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오동동(梧桐洞'지금의 선기동 오릿골로 추정됨)에 묵은 밭을 내주어 생계를 도왔다. 정이오는 나중에 예문관 대제학이 된 인물로 길재와 관료 생활을 같이하고 글로서 사귀기도 했다. 길재의 충절을 존경하던 그가 길재의 고향으로 부임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이 무렵 길재의 은둔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고 배움에 굶주린 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길재는 애초에 홀로 공부하고자 했으나 단순히 글공부를 하려는 사람들부터 경전을 토론하고 성리학 강해를 들으려는 학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길재는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글을 가르쳤으며 학자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도와주려는 손길도 뿌리쳐
숨어 산 지 10년 만인 1400년에 왕세제 이방원이 형인 정종(定宗)에게 길재에게 벼슬을 내릴 것을 건의해 받아들여졌으나 길재는 한양에 가서 자신의 뜻을 상소로 전하며 끝끝내 거절했다. 길재는 50세 때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고 뒤이어 장남 길사문이 죽는 슬픔을 맞게 된다. 그는 아들의 상을 맞아 참쇠복(斬衰服)을 지어 입었다. 1403년에 고을 군사(군수) 이양이라는 사람이 길재의 사는 형편이 곤궁하자 지금의 도량동 율리(밤실) 부근에 기름진 논밭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길재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으면 뜻을 끝까지 보존할 수 없다"며 하루 세끼 연명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줬다. 이 해에 경상도 관찰사 남재(南在)가 길재에게 가묘를 지어 드리고 좀 더 나은 거처를 마련해 줬다.
부자였던 길재의 장인 신면도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길재를 도와주려 했다. 자신이 소유한 노비 10여 명이 도망친 후 길재가 우연히 그들을 찾아내자 길재의 소유로 하게 해줬으나 길재는 끝내 노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다. 그전에도 장인이 여러 차례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길재는 완곡히 거절하던 터였다. 이에 장인은 화가 나 "벼슬도 마다하고 노비도 마다하니 아무래도 남과 같이 살기는 틀렸구나"라고 소리쳤다. 길재는 외종형인 스님이 법손(法孫)에게로 전해질 노비를 길재의 차남 길사순에게 남겨주고 죽자 그 또한 부당하다며 아들에게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
길재는 낙향 후 금오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대혈동에서 살다가 나중에 지금의 선기동을 거쳐 도량동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정이오와 이양, 남재 등 그를 아끼고 존경하는 관리들이 생활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집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혼자 학문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산중 마을에서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고전문학 연구가 이택영 씨는 "길재 선생과 관련된 기록에 대혈동에 살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후에 거처를 옮겼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대혈동에서만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도량동 등 다른 장소로 옮겨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고 말했다.
1414년 가을에 장인 신면이 숨지자 길재는 "내가 신씨 가문에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무거웠다"하고 잠시 대리상주 역할을 했다. 상주가 군역에 종사하느라 100여 일 후에 돌아오자 상복을 넘겨줬다. 1418년에 태종 이방원이 길재의 절의를 존중하고 권장하기 위해 그의 차남 길사순을 등용하고자 했다. 길재는 아들에게 "내가 고려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본받아 너의 조선 임금을 섬긴다면 네 아비의 마음은 더 바랄 것 없다"라며 출사를 허락했다. 길재는 67세이던 1419년에 세상을 하직했다. 그의 벗 남재도 이 해에 세상을 떠났다. 길재의 병환이 위중하자 신씨 부인이 아들 길사순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임금과 아비는 일체다. 이미 임금에게 가 있으니 부고를 듣고 오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다. 길재는 마지막까지 그다운 모습을 보이고 갔다.
김지석 기자 jiseok@msnet.co.kr
사진 한태덕 사진 전문 프리랜서
도움말: 길화수 (사)금오서원보존회 부이사장(야은 길재 17대 종가손)
이택용 경북정체성포럼 선비분과위원(고전문학 연구가)
김석배 금오공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박인호 금오공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