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가슴 설레던 대학 새내기 시절, 나는 입학식을 마치고 곧바로 민속문화연구반이란 동아리를 찾아갔다. 학교 지리를 몰라 대학 본부까지 가서 민속문화연구반의 위치를 물어 동아리를 찾아냈다. 마침 동아리엔 서너 명의 회원들이 있었고 나를 소개한 후, 회원이 되기 위해 찾아왔노라고 했다. 몸집이 퉁퉁한 선배가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 선배는 3학년으로 이름도 나와 같았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했던가?
보통 동아리 신입생 모집은 4월경인데 입학식 치르자마자 제 발로 찾아온 내가 그들에게 신기했던 모양이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즉석 시연을 해 주겠다며 몇몇 선배들이 나를 잔디밭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흐느적거리며 장단에 맞춰 탈춤을 추었다. 관객은 달랑 나 혼자였고 지나가는 이들도 없던 강당 뒤편 한쪽 구석에선 풍물소리만 우렁차게 들렸다.
그 소리 때문인지 몇몇 학생들이 춤판을 기웃거렸고 마침내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반백발의 신사 한 분이 지나쳤다. 그때 3학년 선배 하나가 추던 춤을 멈추고 "총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넙죽 큰절을 올렸다. 그 신사분은 "어…고마워" 하고 절을 받더니 큰절을 올린 선배더러 오라는 손짓을 했다. 껑충한 키에 얼굴을 반이나 가린 검은 뿔테 안경을 추켜올리며 삐쩍 마른 방아깨비 같은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그 선배에게 신사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대뜸 2만원이란 지폐를 건넸다. "자, 받아. 세뱃돈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춤꾼들은 풍물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였다. 2만원이란 거금 앞에 우린 갑자기 합동 세배꾼이 되었고 총장이란 그 신사분은 손을 흔들면서 유유히 사라졌다.
2만원이란 세뱃돈을 받아들고 늦은 밤까지 막걸리 파티를 벌인 기억이 새롭다. 시내버스비가 100원,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이 500원이었으니 2만원의 거금은 거의 횡재 수준이었다. 그 막걸리 파티는 내가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간 건지 혼란스러운 운명의 첫날이었다.
대학에선 이미 전통 관련 동아리는 그 명맥을 잃은 지 오래다. 새내기들이 없어 문을 닫은 동아리들이 대부분이다. 경제논리에 밀려 대학가에서 퇴출당한 것이다. 한때 대학 낭만의 꽃이라 불린 동아리 활동은 언제부턴가 취업준비로 갈 길을 잃었다.
우리 세대는 당시 마지막 남은 인간문화재들에게 전통문화를 전수받은 귀한 몸(?)들이다. 내 또래의 올드보이들이 어디선가 건재해 있다면 그들에 의해 사라진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들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고 싶다. 그 옛날 멋쟁이 총장님 같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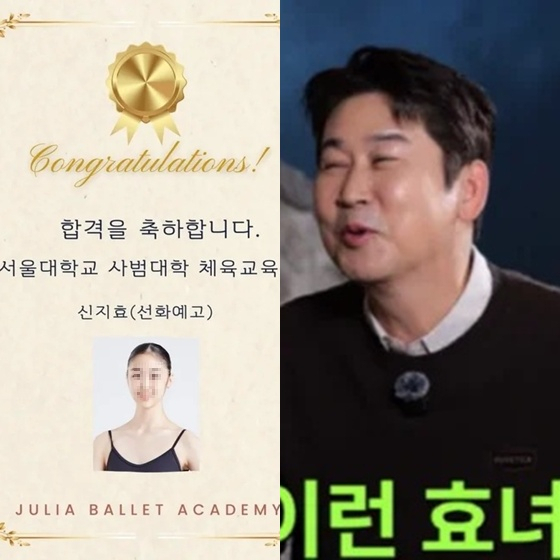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