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러기 두보
외기러기,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孤雁不飮啄(고안불음탁)
울고불고 날아가며 가족들을 찾고 있네 聲聲飛念群(성성비념군)
누가 가련하다 할까, 저 외로운 기러기가 誰憐一片影(수련일편영)
만 겹 구름 속에서 서로 잃어버린 것을! 相失萬重雲(상실만중운)
시야에서 사라져도 눈에 자꾸 밟혀오고 望盡似猶見(망진사유견)
어찌나 슬프던지 또 그 울음 들리는 듯 哀多如更聞(애다여갱문)
떼로 모인 들 까마귀 정말 무심하기만 해 野鴉無意緖(야아무의서)
까윽까윽 울어대며 저들끼리 야단법석 鳴噪自紛紛(명조자분분)
*원제: 고안(孤雁)
위의 작품은 시인이 어느 날 대열에서 이탈된 외기러기 한 마리를 발견하는 데서 시상이 시작된다. 가족들과 함께 만 겹 구름 속을 일렬종대로 날아가다가, 잠시 멍 때리는 사이에 그만 낙오가 된 외기러기다. 그 외기러기는 마시고 먹는 것을 전폐한 채로, 가족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저 광활한 천지를 울고불고 나는 저 외기러기를 가련하게 여기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외기러기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들끼리 모여 떠들어대는 들 까마귀 같은 것이 세상인심이다.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이에, 그 외기러기는 시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자꾸만 그가 눈에 밟히고,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자꾸만 다시 들려온다.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환시(幻視)와 환청(幻聽) 상황은 대상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도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 외기러기에게 그토록 애틋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시를 지은 두보(杜甫, 712~770) 자신이 혼밥을 먹고, 혼술을 마시고, 혼잠을 자는 날이 많았던 당나라 시대의 혼족이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가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진 채로 천지 간을 떠돌아다녔던 시인 자신이 바로 외기러기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시는 시종일관 외기러기를 노래했지만, 실상 시종일관 자기 자신을 노래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식음을 전폐하고 엉엉 울어댄 것도 물론 두보 자신이다.
"나비다!/ 뜻밖인 듯 아이가 소리친다/ 전동차 한곳으로 옮겨 붙는 시선들/ 가녀린 나비 한 마리 가는 길 묻고 있다// 깜박 졸다 지나친 역 여긴 어디쯤일까/ 무심코 따라나선 꽃향기 사라지고/ 이제야 보이는 수렁 너무 깊이 들어왔나// 축 처진 어깨처럼 한풀 꺾인 날갯짓/ 전동차 손잡이에 애처로이 매달릴 때/ 인생길 잠시 접은 채/ 나비가 된 승객들" 이광 시인의 시조 '지하철 탄 나비'다. 세상에, 나비가 지하철을 타다니? 잠시 멍 때리는 사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하철을 타게 된 나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바로 그 나비 위에 외기러기 두보가 겹쳐지고, 그 위에 다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시대의 혼족들이 겹쳐진다. 입동이 지나면서 바람도 점점 차가워지는데, 다들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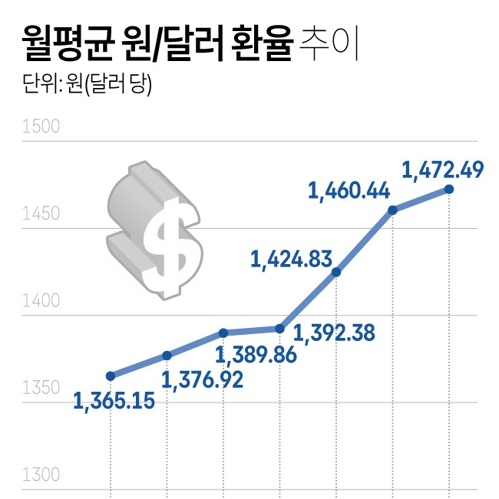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