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주인공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표준어를 사용한다. 반대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다. 극에서 악당이나 감초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투리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비롯한 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표준어를 주로 쓰는 것이다. 거기에 표준어를 바른말 고운 말과 동일시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면서 사투리와 표준어 중 어떤 말을 선택해서 사용하는가가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표준어는 소쉬르가 이야기한 '랑그'에 가깝다.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규칙 체계로 개인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랑그를 공유하고 있다면 의사소통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사람들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인 '파롤'은 개인마다 음파가 다르고, 그 말이 사용된 시공간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는 말이다. '각중에, 을기미, (옷이) 쫑기요, (모를) 머드리라' 이런 말들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실제로 사용했던 고향의 할배, 할매, 아재, 아지매들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말에서 정감이 느껴진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솥뚜껑을 엎어서 소깝을 때면서 굽던 것은 '부추 전'이 아니라 '정구지 적'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바로 사투리는 실제 사용된 말이기 때문이다. 사투리는 이처럼 매끈한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감들과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표준어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변산'에는 래퍼가 되기 위해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공 학수가 등장한다. 변산반도가 있는 전북 부안이 고향이지만 사람들에게 서울 출신이라고 하고 다닌다. 그에게 사투리는 외면하고 싶은 고향의 기억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입원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기억들과 마주하지만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된다.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를 쓰는 학수에게 작가가 된 여자 친구 선미는 이야기를 한다. "사투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여." 그것은 마음속에 고향이 있고, 그리운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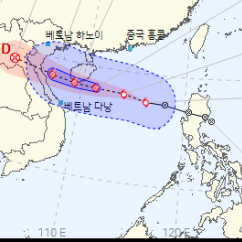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