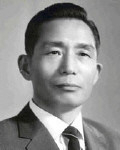
잼라이브 2월 12일 힌트는 '연임제 VS 중임제'이다.
▶두 단어는 임기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각국 대통령 제도를 설명할 때 붙는 단어이다.
대통령 연임제(連任制)는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단, '연속'이 조건이다. 첫 임기를 마친 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重任制)는 어떤 직위나 직책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다. 단 여러 번의 기준을 2회로 정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2회만 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 '2회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즉, 연임제와 달리 첫 임기를 마친 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차후 언제든 출마해 한 번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혼용된 경우도 있다.
칠레 대통령의 경우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즉, 대통령 임기를 연속으로는 할 수 없지만, 중간에 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고 3선(3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연임 자체의 횟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현 푸틴 대통령은 연임 후 한 차례 쉬고(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자신은 총리) 다시 연임에 나섰다. 제도 자체가 장기집권에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제도의 변천사가 바로 '연임제 VS 중임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중임제였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이어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5년 중임제로 바꿨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을 3선(3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3년 뒤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내놓으면서 연임 제한을 없애 사실상 종신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하며 7년 단임제를 채택했다.
이어 민주화 물결이 대한민국을 휩쓴 여파로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서 현재의 5년 단임제가 도입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및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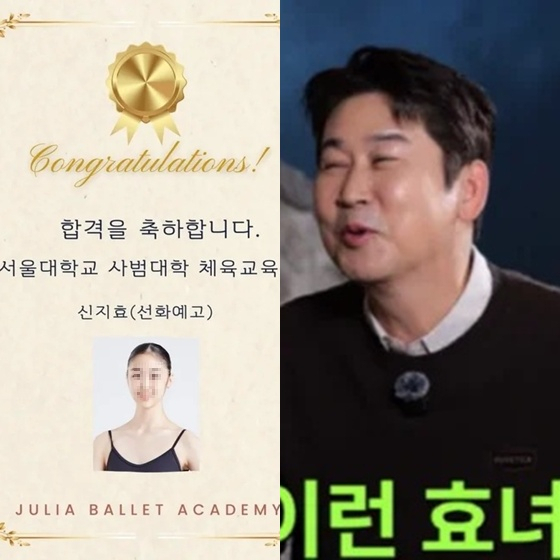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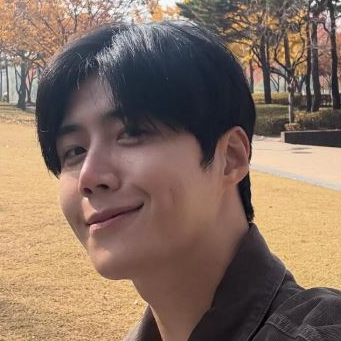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