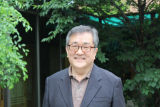
대구시민주간은 봄을 여는 축제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잔치다.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외쳤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어떤 정치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판단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다. 시민은,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온 세상에 고했다. 대구시민주간은 이러한 시민의 존재를 확인하는 축제(祝祭)의 장이다.
그런데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다. 시민은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되었나? 대답의 실마리는 대구의 역사에 있다. 세 차례의 역사적 계기가 그것이다.
첫 번째는 1864년 봄, 수운 최제우의 순교다. 대구 경상감영 감옥 안에서 사형당한 동학사상의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는 곧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양반 귀족만이 하늘의 도리를 알 수 있다고 여겼던 봉건시대의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늘의 이치를 아는 존재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상과 운동에 '시민'의 배아(胚芽)가 있었다.
두 번째는 1907년 봄,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나왔다. 힘센 존재가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후 전국적으로 퍼진 자주 사상과 운동은 근대의 '시민'을 잉태(孕胎)하였다.
세 번째는 1960년 봄, 2·28민주운동이다. 이는 4월 혁명의 출발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세상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민혁명이었다. 이것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널리 번져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존재 '시민'이 탄생(誕生)한 것이다.
반봉건(1864년 봄)-반제(1907년 봄)-반독재(1960년 봄)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계기가 대구의 봄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2월 마지막 한 주를 시민주간으로 정하고 그 역사의 봄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봄을 여는 축제, 대구시민주간에 더 자유롭고 더 역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기를 바란다. 대구시민주간이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계기를 넘어 또 다른 역사의 봄을 만드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역사의 봄이란 무엇일까? '시민'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성장'에 주력했다. 도시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길이 넓어지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즉 '도시의 성장이 곧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찰이 생겼다. 도시의 성장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또 다른 역사의 봄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본다. 대구시가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꿈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 꿈이 영글어가는 대구시민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의 봄과 함께 계절의 봄도 창밖에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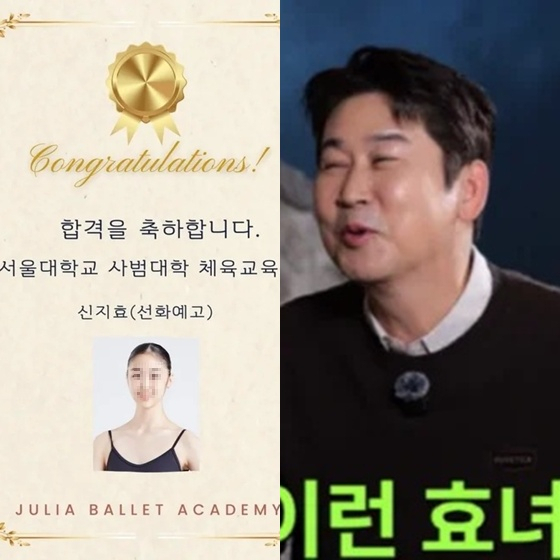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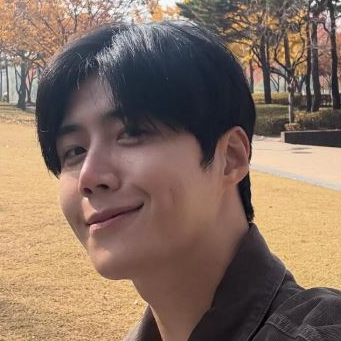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