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성산인의 안식처, 성산동고분군
1960, 70년대 겨울방학 무렵이면 성주읍내 중학생들은 가까운 야산에 모여 토끼몰이를 했다. 당시 행사에 나섰던 이들의 후일담을 보면 토끼몰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체력을 키우고 협동심도 기르는 연례행사였다는 것이다. 도회지 학교에서는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엄두도 못낼 일이지만 진풍경임에 틀림없다.
성주 군청을 등지고 이천(伊川)을 건너면 지금은 참외 비닐하우스로 가득한 너른 들이 나온다. 논밭을 따라 남동쪽으로 20분가량 걷다보면 닿는 곳이 바로 별뫼, 곧 성산(星山)이다. 높이 389m로 성주의 진산인 성산은 50, 60대 장년층의 추억이 서린 토끼몰이의 무대였다. 등굣길에 몽둥이를 하나씩 준비해 신호에 따라 산천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지르며 헤집고 다닌 곳이다.
◆별뫼에 묻힌 사람들
성산 서쪽 사면의 승왜리 마을과 그 아래쪽 살망태 마을 주변에는 원형 봉토분이 산재해 있다. 1963년 사적 86호로 지정된 성산동고분군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분만 모두 129기로 5~6세기 성주를 터전으로 했던 성주 사람들의 안식처다. 이 고분군은 성산가야 고지(故地)를 지켜온 역사의 증인이자 성주의 뿌리나 마찬가지다. 비록 후세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성산동고분군은 성주의 옛 자취와 정치·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성산동고분군이 학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이마나시 류(今西龍)의 지표조사가 그 출발이다.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른 조선고적조사의 하나로 일제의 관학자들이 성주지역 고분군 분포와 위치를 조사했다. 성산동고분군과 월항면 용각리·수죽리고분군, 금수면 명천리고분군 등 7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듬해 성산 서쪽 기슭에 있는 구(舊) 1호분과 2호, 6호분을 시작으로 대분(大墳)과 팔도분(八桃墳)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는데 뚜껑 있는 이단투창고배(有蓋二段透窓高杯), 굽다리 긴목항아리(대부장경호) 등 토기류와 5~6세기 신라와 가야, 백제 분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자루 끝에 둥근고리가 있는 환두대도 등 유물이 출토됐다.
하지만 이마나시의 보고로 1920년에 출판된 고적조사보고서와 '가라경역고'(加羅境域考)에 고분의 분포와 위치 등이 도면·사진과 함께 간략히 소개될뿐 공식 발굴보고서 없이 넘겨버리면서 성산의 고분은 또다시 긴 잠에 빠져들었다.
◆1986년 첫 공식 발굴조사
성산동고분군이 세상에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뒤다. 1986년 10월 계명대 박물관(관장 김종철)이 직접 2천770만원의 비용을 대고 성산동고분군 발굴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당시 성산가야 지배세력의 존재를 보여주는 1천점이 훨씬 넘는 토기와 무기류, 금속품 등 유물이 햇빛아래 환히 드러났다.
일반 대중이 이 유물과 첫 대면한 것은 1988년 5월 계명대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다. 당시 '성주성산동고분' 특별전시회에는 1차 정리를 거친 350여점의 출토 유물이 선보였다. 함께 발간한 도록에는 출토 유물을 촬영한 컬러·흑백사진과 38, 39, 57, 58, 59호 고분에 대한 조사개요(집필 김세기)가 도면과 함께 수록돼 있다.
하지만 자세한 발굴조사보고서가 학계에 정식 보고된 것은 한참 뒤인 2006년이다. 발굴단이 5기의 성산동고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지 꼭 20년만에 '성주성산동고분군'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목차를 빼고도 모두 76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고서 발간이 이처럼 늦어진데는 수습된 1만여 점에 이르는 수많은 토기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붙이고 금속류를 보존처리하는데만 근 10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장 김권구 교수는 "고대 성주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유적"이라며 성산동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성산동 유물의 실체
4세기 중후반이나 5세기 초 성주지역은 대구 등 신라 문화권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정치'문화 모든 분야에서 신라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런 변화는 당시 성주지역의 생활상 등 문화적 관점에서 가야적 색채의 퇴조와 함께 성주지역의 빠른 '경주(慶州) 양식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가야의 맥을 잇고 신라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흡수한 이들의 안식처인 성산동고분군은 그 자체로 주목해야할 유산이자 역사 자료다. 특히 이곳에서 쏟아진 유물들은 신라의 영향권에 속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성주양식의 지역적 특징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냥 흘려넘길 일은 아니다. 주체부 석실에 감실(龕室) 부곽을 붙여 설치하는 철(凸)자형 묘제는 성주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많은 고분에서 드러난 수혈식 석실 묘제나 토기 양식, 굵은 고리식 금귀걸이와 은제 관식 등 위세품은 모두 신라의 그것과 빼닮았다.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는 '고분자료로 본 삼국시대 성주지역의 정치적 성격' 주제의 논문에서 '삼국시대 성주지역은 신라문화권에 속하며 토기 양식으로 봐서는 적어도 4세기 중후반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신라의 영역에 편입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그렇다면 성산동고분이 만들어진 시기를 전후해 성주사회의 변모를 재촉한 동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경자년(서기 400년)때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5만 군사의 남정(南征)이 가야 세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사건이 경주를 포함해 경상도 지역과 낙동강 유역 전반에 걸쳐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요인이라는 것이다. 당시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가야·왜(倭) 세력에 대한 공격은 '5세기 이후 낙동강 동쪽의 부산과 창녕 지역, 낙동강 서안의 성주를 포함한 중상류 지역에 대한 가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였다'(김태식 교수)는 주장도 있다.
1천 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물과 비록 편린뿐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이해나 해석과 견줘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산동 고분의 유물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사적 가치는 그것대로 의미가 크고 잘 지켜야할 유산으로서 결코 모자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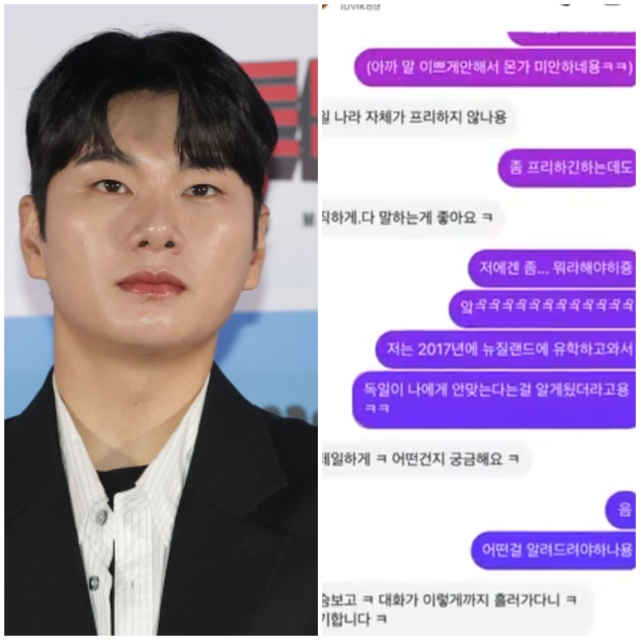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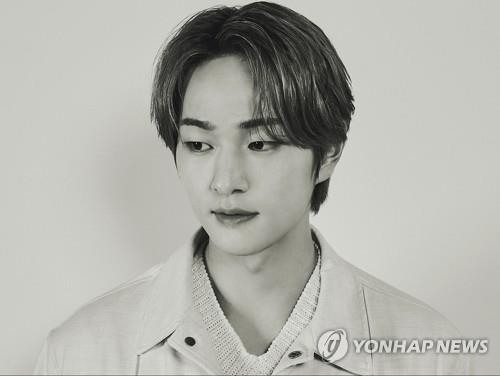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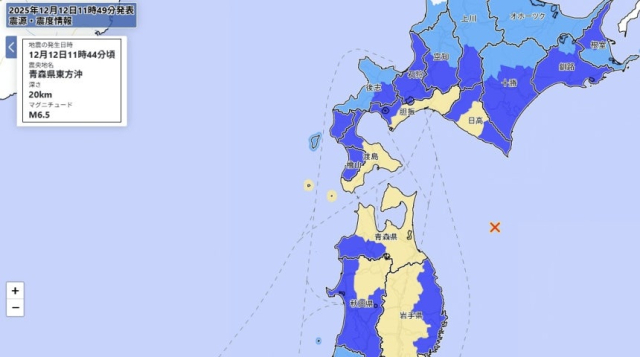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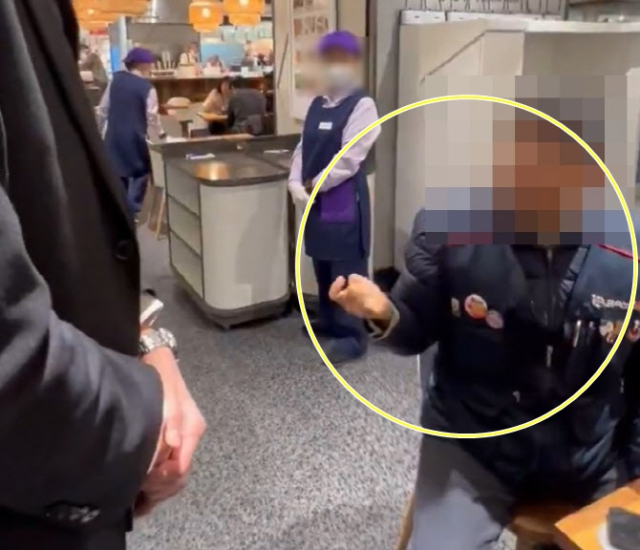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