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봄. 모두에게 힘든 봄이다. 옛사람들에게 봄은 구세주였다. 사계의 순환을 자연의 섭리로 여겨 봄여름가을겨울을 마땅히 받아들이지만 봄은 특별했다. 솜옷이나 누비옷, 화로도 있었지만 지금의 패딩이나 난방 기구에 비할 바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 몸을 오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봄을 기다렸다.
봄을 기리는 말도 봄을 기다리는 대춘(待春), 봄을 맞이하는 영춘(迎春), 봄을 즐기는 상춘(賞春), 봄을 보내는 송춘(送春) 등 다양하다. 봄의 기쁨을 담아 음력 3월을 희월(喜月), 가월(嘉月), 화월(花月), 도월(桃月), 앵월(櫻月), 잠월(蠶月)이라고 했고, 봄의 마지막 달이라 계춘(季春), 전춘(殿春), 만춘(晩春), 모춘(暮春), 잔춘(殘春) 등으로 불렀다. 봄이 사라지는 날인 잔춘일(殘春日)도 있었다. 음력 3월 30일 그믐날이다(올해는 4월 22일). 이 날 호사자(好事者)들은 다한 봄을 아쉬워하며 산과 계곡을 찾아 봄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보냈다.
이도영의 '세검정(洗劍亭)'에 "관재(貫齋) 작우(作于) 소림사(少林寺) 시(時) 을축(乙丑) 잔춘일야(殘春日也)"라는 화제가 있어 이 날을 맞아 이도영이 세검정으로 원족(遠足) 갔음을 알 수 있다. 세검정은 한양도성의 사소문(四小門) 중 북쪽 소문인 창의문(자하문) 근처에 있어 성내에서 멀지 않은 경치 좋은 명소로 일찍부터 알려졌다. 멀리 삼각산과 북한산이 보이고 그곳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모여 시내를 이룬 홍제천과 화강암 너럭바위가 어울려 맑은 물과 빼어난 바위의 수석(水石) 경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장마가 지면 해마다 도성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 구경"을 한 유명한 계곡이고, '국도팔영(國都八詠)'에 '세검빙폭(洗劍氷瀑)'으로 꼽힌 사철 명소였음이 『동국여지비고』에 나온다.
홍제천 화강암 암반 위에 지어진 세검정은 지붕과 평면이 정(丁)자형인 특이한 모양이다. 영조 23년(1747년) 도성을 방어하는 총융청이 이 근처로 옮겨와 북한산성 수비까지 맡게 되면서 군영 부설의 정자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총융청은 1884년(고종 21년) 폐지되면서 빈 터만 남았다가 세검정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세검정의 주소는 종로구 신영동(新營洞) 168-6번지인데, 영조 때 새 군영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신영'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남았다. 세검정은 1941년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 건물은 1977년 복원한 것이다. "칼을 씻는다."는 정자 이름은 인조반정의 주동자들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폐위를 의논하고 칼을 갈아 씻었던 데서 나왔다고 한다.
1925년 작품인 '세검정'은 실경을 그린 산수화이다. 정자와 초가집은 실제 모습을 그렸지만,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다리 위의 인물이나 세검정 뒤 소림사로 이어지는 길 등은 화보풍이다. 바위를 빈틈없이 모두 색칠했고, 보랏빛을 머금은 청색과 황갈색, 황색,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등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안중식의 수제자인 이도영의 '세검정'은 전통 산수화의 틀 안에서 서양화풍을 활기 있게 절충해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산수화이다.
미술사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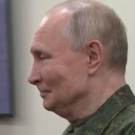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