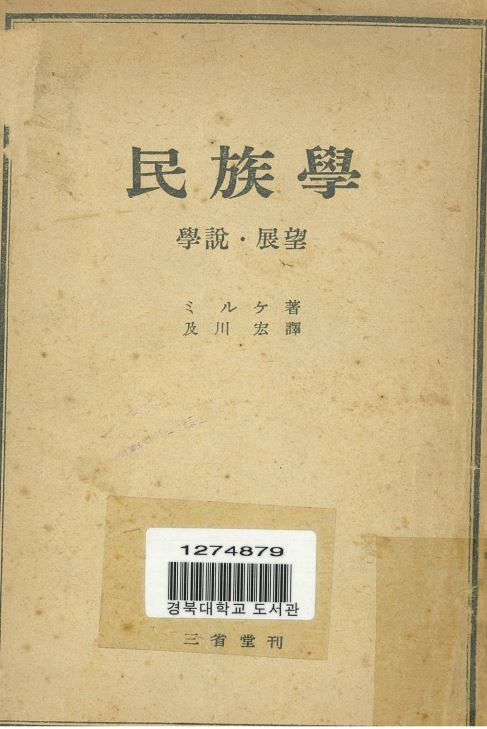
누군가의 서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의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5층에는 개인이 평소 소장하던 도서를 기증받아 만든 개인 문고가 있다. 일반 서가와 분리되어 있는데다 전문서적이 많다 보니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개인 문고의 서가를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으면 책을 기증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 개인 문고 중에는 와타나베 히토시라는 일본인의 소장 도서를 모아둔 '와타나베 문고'가 있다.
와타나베는 1919년 태어나 1998년 숨졌다. 그는 도쿄대 이학부 인류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일본 북방 원주민 아이누족에 관한 연구를 했다. 도쿄대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은 일본 연구자의 책이 어떤 이유로 한국의 경북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일까.
와타나베가 죽은 해인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와타나베가 죽은 지 2년 후인 2000년, 그의 아내가 남편이 남긴 책 중 약 2천500권을 경북대 도서관에 기증한 것에는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개선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듯하다.
'와타나베 문고'의 책을 한 권, 한 권 들춰보다 보면 그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문학 관련 서적이라고는 문고판 세계문학 전집과 수필책 몇 권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문학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반면 인류학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인종과 민족에 관한 연구서, 지층학 전문서,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발행의 인류학 잡지 등 인류학 관련 전문서가 많다. 인류학 관련 서적 중에는 '민족학'(1944)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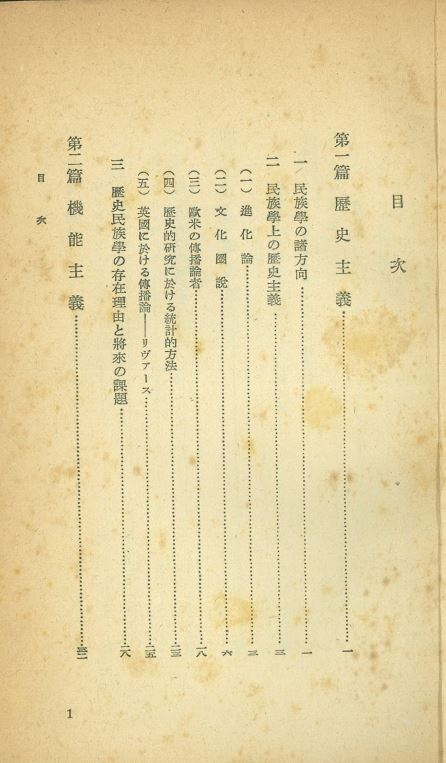
'민족학'은 밀케라는 독일학자가 민족학에 대해 쉽게 풀어쓴 개론서로 1944년 일본어로 번역된다. 와타나베는 제국주의 말기인 1942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제국대학 이학부(자연과학대)에 입학해 인류학을 공부한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와타나베는 '민족학'을 교재로 해서 인류학 전공 수업을 들었던 듯하다. 오래되어서 종이 여기저기가 바스라지기 시작한 책에는 교수님 설명을 받아 적은 듯한 연필 필기와 중요 표시가 군데군데 붙어있다.
이 시기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잡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과 대학생 와타나베가 선택한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이들 전쟁 유발국에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내세워 민족과 인종을 우, 열로 나눈 후,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우등 민족에 의한 열등 민족의 보호라고, 교묘하게 합리화시켜 준 것이 바로 '인류학'이었다. 민족학은 그 인류학의 한 분파였다.
20대 초반의 와타나베는 도쿄제국대 문화인류학교실에 소속돼 '인종학', '민족학'을 배우면서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마음에 심어갔던 듯하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채 졸업하기도 전에 그 '우월한' 일본은 패전하고 만다. 그는 공습으로 초토화된 도쿄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는다. 이후 그는 인류학의 보고로 불리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구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갔다.
일본의 패전이 그를 순수한 연구의 길로 이끈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원래부터 순수한 자연과학적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쨌건 그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억압하고 해치는 일에 쓰기보다는 인간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사용했다.
와타나베가 죽은 지 20년도 더 지났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한 연구자가 그의 서가를 둘러보면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읽어내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알게 되면 그는 뭐라고 할까. 책을 기증하면 책만이 아니라 책을 기증한 사람의 삶도 함께 전해지게 된다. 개인 문고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정혜영 경북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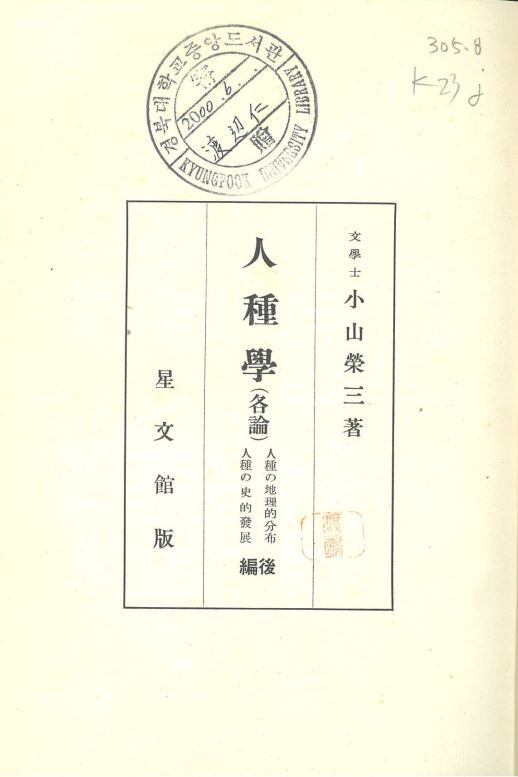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했다…깊이 사과"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