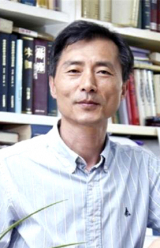
온통 돈, 돈, 돈이다. 세상이 아주 돈에 목을 맨다. 세상에는 돈에 대한 충성 서약과 황금에 대한 순교자들로 넘쳐난다. 주식, 펀드, 가상화폐의 열풍은 눈물겹다. 황금만능이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정치든 종교든 처음에는 그럴싸한 이야기로 출발하나 결국은 돈에서 끝난다.
문득 한 스님의 유머가 생각났다. "도를 닦으러 출가했는데, 아니 '도'자 밑에 자꾸 ㄴ자가 어른거려 '돈'독이 올랐다가 결국 '돌'중이 돼 버렸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어 허허 웃고 치웠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도→돈→돌'로 얽혀 드는 인생사가 짠하게 다가온다.
2년 전 어느 신문에서 '한국은 어쩌다 사기 범죄 1위 국가가 됐나'라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그때 우리나라 범죄 발생 비율은 절도보다 사기가 훨씬 높아 국내 1위를 기록했고, 세계적으로도 사기 범죄 발생률이 최고라 했다. 사기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속는지 모르겠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청소년이 많았다는 점이다. 윤리나 법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단다. 이런 세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니 더욱 심해지는 듯하다. 보통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란다. 반면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란다. 그러면 주식과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좀 헷갈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왜 투기, 사기가 증가했을까. 생각해 보면 돈 이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불안 심리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에 무지하면 가난해지게 마련이다. 대학생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대부분 주식 등에 투자한단다. 안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딱 깨놓고 돈 잘 버는 '대박 학과'쯤 개설하는 것도 좋을 법하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가 신용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추상적 정치 쇼보다는 차라리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챙겨줄 돈에 기댄 각자도생이 나을 것이다. 먼 장밋빛 미래냐 눈앞의 현금이냐? 당연 현금이다. 현진건의 단편작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을 말하고 있지만, 작금의 '돈 권하는 사회'는 현실 정치인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회보다도 확실한 지금이 더 다급하다.
정치는 졸(卒)이고 돈이 왕 노릇하는 시대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는 법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투기나 사기를 증폭시킨다. 현실 정치가 채우지 못한 불만과 불안감을 돈으로 충족하고 싶은 심리인 것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적 본능이다. 중국에서 사랑받는 차 번호 가운데 58888이 있다. 5(五·wu)는 나 '아'(我·wo)와 발음이 비슷하다. 8(八)은 광둥어 발음 발재(發財·fa cai)의 '발'로, 돈 많이 버세요(恭喜發財·gong xi fa cai)로 통한다. 따라서 58888은 '나는 돈을 많이 번다'(我發財)는 재물 축적과 풍요를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5'라는 숫자는 오행사상에서 보면, '믿을 신'(信)과 '흙 토'(土)를 상징한다. 예컨대 우리 한양 도성의 중앙에 보신각(普信閣)의 '신'이 바탕해 동쪽의 흥인(興仁), 남쪽의 숭례(崇禮), 서쪽의 돈의(敦義), 북쪽의 숙정(肅靖)이라는 문들이 열리고 닫히듯 '믿음'은 사통팔달의 플랫폼이 된다.
풍진만 가득한 세상,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자꾸 무언가를 밀고 올라가는 5월의 초목들을 바라본다. 주식과 가상화폐에 매달리는 2030세대가 그렇듯, 살아 있는 존재들이 향하는 곳은 구체적 현실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기(天崩地坼) 전에는 지금 이곳이 믿는 구석이다.
갈수록 정치는 졸(卒)이고 돈이 자꾸 왕 노릇 하려 드는데, 글쎄 5월은 어린이도 부모도 스승도 주인공으로 버티고 서 있다. 마디마디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며 천천히 가란다. 그래야 단번에 뚝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