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조는 민족문학사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고시조를 특징짓는 '전통시가'에서 노래의 영역인 '가(歌)'를 분리시키고 가독성을 중심한 인쇄문화로 정착한 문학형태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불특정 다중과 만남에서의 공감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효용성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만이 아니라 삶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선도해 주기를 바라는 가수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아마추어리즘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적 작법은 자신의 만족이 우선이지만 인쇄를 통한 대상의 확장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아서 동질감이 들어서 만족한다는 공감의식만으로는 좋은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이나 등을 두드리는 손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탕이 녹아 없어지고 손길도 지쳐 사라지면 다시 울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좋은 시는 바로 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처방전을 지녀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시조는 과연 어떤 요소들을 지녀야 할까. 우선 역사의 긴 흐름 위에서 시대적인 정신을 읽고자하는 건강한 생각과 민족문학에 대한 사랑이 행간에 스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관찰과 깊은 사색이 덧대어져서 문장이 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조가 삶의 체험에서 발견한 창조적 질서를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보다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쳐 통찰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의 창조적 우주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매우 쉬우면서도 사유를 거쳐 통찰을 겨냥하고 있는 한 시편을 보겠습니다.
따슨 볕 등에 지고 유마경을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 밑 글자를 읽어 무삼하리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춘주'(春晝)라는 작품입니다. 독백체로 쓰인 문장이기도 하지만,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눈에 선하고 문장도 무척 쉽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짧은 문장이 지닌 상상력과 메시지의 힘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마경'을 읽는 행위는 결국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에 의해 꽃잎이 떨어져 읽던 글자를 자꾸 덮어버립니다. 경전을 계속 읽기 위해 꽃잎을 털어내려다 문득 깨달은 것이 "유마경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지는 꽃잎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낙화 한 순간으로 깊고 오묘한 이치에 도달한 것은 물론 한용운 스님이 수행자이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쉽고도 처방전이 적확한 명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작품이라면 고시조를 넘어선 온전한 현대시조가 아닐까요.

민병도 시인
민병도 시조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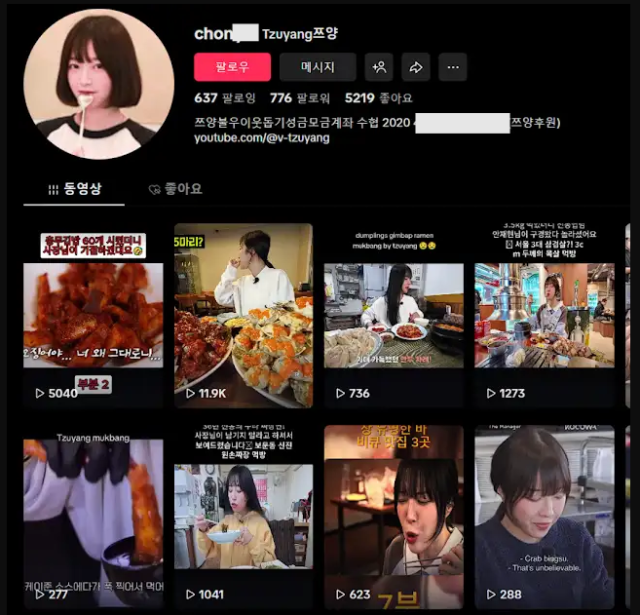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