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이란 음식이 있다. 이걸 보면 '묵묵부답'(黙黙不答)이란 말이 생각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절기 야심한 밤에 찹쌀떡과 함께 팔렸던 메밀묵. 묵에는 한민족의 유전자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묵묵한 표정, 꼭 문종이 같다. 예전 민초들의 삼베옷처럼 질박한 결이 어른거린다. 메밀‧도토리묵에서는 두부, 청포‧황포묵에서는 한천(우뭇가사리)으로 만든 우무의 질감이 느껴진다.
◆한국의 묵지도
묵의 영향권은 칼국수, 냉면, 비빔밥, 전골, 탕 등에도 닿아있다. 요리학적으로 다양한 '변화구'가 가능한 먹거리다. 묵처럼 한국적인 정서를 깔고 있는 음식도 드물 것이다.
한국 묵의 3대 재료는 메밀‧청포‧도토리.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별미 묵이 있다. 바로 '물밤묵'으로 알려진 '올방개묵'이다. 올방개는 사초과 다년생 풀인데 논 등 습지에서 자란다. 자라면서 뿌리에 혹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토란과 비슷한데 전분을 추출해 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내게는 도토리가 가장 한국적인 묵 재료로 다가온다. 여기서, 헷갈리는 대목이 있다. 도토리와 꿈밤은 같은 열매인가 하는 점이다. 속내를 알려면 일단 참나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우리 산하의 대표 수종 둘을 들라면 단연 소나무 아니면 참나무(나중에는 아까시나무도 가세했지만)이다. 참나무는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다. 모두 6종류가 있다. 떡갈‧졸참‧신갈‧갈참‧상수리‧굴참나무. 굴피집을 만들 때는 굴참나무 껍질이 이용된다. 아무튼, 상수리 열매는 도토리, 나머지 5종류 나무 열매는 꿀밤으로 분류된다는 게 식물학자의 견해다. 도토리는 동그스름하고 꿀밤은 길쭉하다. 이와 비슷한 열매 중에 떡속소리나무에서 달리는 '속소리'도 있다. 강원도 삼척지방에서는 도토리묵을 '밤묵'이라고 한다.
도토리묵의 특유의 떫은 맛은 잊을 수가 없다. 특히 추억의 민속주점 묵무침 때 많이 기용된다. 만드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가을에 주운 도토리 껍질을 까서 잘 말린 후 절구로 빻은 것을 물에 담가 떫은맛을 우려낸다. 앙금과 물이 분리되면 웃물만 따라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 가라앉은 앙금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를 물에 풀어 풀을 쑤듯이 끓이다가 끈적끈적하게 엉길 때 그릇에 부어 식히면 된다.
묵요리는 엄마의 고단함을 먹고 태어난다. 묵이 다 응결될 때까지 화장실 가는 것까지 포기해야 된다.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금방 눌러붙고, 그럼 화근내 때문에 먹기 곤란해진다. 다 저었는가를 판별하는 법이 있다. 주걱을 세웠을 때 쓰러지지 않으면 다 된 거다. 예전 춘궁기 때는 도토리가루를 쪄내 개떡을 해 먹기도 했다.
◆메밀묵과 청포묵
묵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건 단연 메밀묵. 가장 분포지역이 넓어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 경상도의 경우 예전에는 도토리묵이 강세였지만 요즘은 메밀묵 세상. 멸치 육수에 칼국수처럼 가늘게 썰어 넣고 양념간장과 묵은지, 김가루가 들어가면 '묵사발'(묵채국)이 된다. 이건 호남보다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유행한 버전이다.
대구의 경우 곳곳에 맛집이 있지만 나름 정평이 난 곳은 대충 이렇다.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근처 '할매묵집', 수성구 만촌동 '안동묵집', 그리고 앞산순환도로상에 있는 앞산손메밀묵 등이 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주 팔우정 해장국거리는 특이하게 '메밀묵해장국'으로 유명했다. 80년대 초만 해도 22개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여기 해장국은 선지해장국 스타일이 아니다. 메밀묵, 모자반, 묵은지, 김가루, 콩나물 등이 들어간 '메밀묵해장국' 스타일.
궁중에서는 색이 어두운 도토리와 메밀묵 대신 옥빛이 감도는 청포묵을 시각적으로 선호했던 모양이다. 특히 조선 영조는 당쟁을 견제하기 위해 채 썬 묵과 갖은 채소와 고기를 잡채처럼 섞은 '탕평채'(蕩平菜)를 만들어 대신들에게 먹였고 그래서 일명 '청포채'(靑泡菜)란 궁중음식으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두 전분을 이용해 만드는 청포묵은 만드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고돼 거의 명맥이 끊어진 상태다. 그래도 경북 북부권은 그 숨결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 예천의 '전국을 달리는 메밀묵(이하 전국)'과 문경 문경새재 1관문 근처 '소문난식당'(폐업)이 대표격이다.
소문난식당의 묵은 강원도 묵요리와 경상도 북부 묵요리의 절충포인트로 일명 '새재묵조밥'으로 불렸다. 1965년부터 영업을 했고 81년 주흘산이 도립공원이 되면서 집단이주를 한 것이다. 주흘산 등산인의 밥상 구실을 했다. 아들 장성우 씨는 부모(장창복·박남복)로부터 묵조밥 요리를 전수해 한때 대구교육청 앞에서 풀코스식 새재묵조밥을 오픈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다. 이 집에서 먹은 묵조밥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예천 읍내에 있는 전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구 청포묵집.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 양종례 대표로 가업이 이어지고 있다. 메뉴는 크게 두 가지. 갖가지 야채와 함께 한상차림으로 내는 '청포묵밥'과 단품으로 내는 푸짐한 탕평채 두 가지. 청포묵밥은 밥과 함께 국수처럼 가늘게 채를 쳐놓은 청포묵과 함께 당근, 미나리, 계란지단과 숙주나물, 김 가루로 오색고명을 얹은 청포정식은 참기름 양념간장을 뿌리고 그냥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 먹으면 된다.
◆태평초
'태평초'에는 예전 민초들의 한숨과 피눈물이 섞여 있다. 특히 영주 생활권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 조선 초까지 큰 고을이었던 소백산 영주는 역모죄에 몰려 왕조의 핍박을 피해갔던 '도망자의 땅'이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 중 숱한 피바람을 일으켰다. 흥주도호부 (옛 순흥면)에서 금성대군이 단종복위음모설을 꾸몄다고 해서 순흥 기점 30리 안 사람을 살육했다. 그 피가 흘러 멈춘 곳이 영주시 안정면 동촌1리 '피끝마을'. 피바람이 지나간 뒤 영주는 먹을 게 없는 고장이 되고 가장 만만한 게 먹을 수 있는 게 묵이었다. 지금도 피끝마을에선 추석 직후 메밀 수확철이면 한시적으로 '태평초'를 판다.
이 태평초는 안동,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대표적 술안주 겸 간식거리다. 일명 돼지고기가 들어간 '돼지고기 묵전골'로 보면 된다. 납작한 냄비에 잘게 썬 김치를 담고 채 썬 메밀묵, 잘게 썬 돼지고기, 깻잎, 들깻가루, 김가루, 팽이버섯 등을 듬뿍 얹고 들기름 뿌려서 불 위에서 바글바글 끓이면 된다. 흥미롭게도 메밀묵의 본가라고 하는 강원도 봉평의 한 식당에서도 벤치마킹해 선보이고 있다. 요즘 대구권 묵채에 멸치 다싯물을 넣고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넣어 끓이면 그게 태평초나 마찬가지다.
소백산 중 오지마을로 꼽히고 '피화기 마을'이 있다. 거기서 한국 전통 묵요리 관련 몇 가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가령 묵에서 단내가 나면 소금 한 움큼을 아궁이에 넣어주면 신기하게 화근내가 안 난다고 한다. 또한 묵을 쑬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뜸 들이는 것인데 솥뚜껑을 거꾸로 닫은 뒤 그 위에 아궁이에서 끄집어낸 숯을 뚜껑 위에 얹는다. 이렇게 해야 뚜껑이 쉬 식지 않고 그래야만 묵을 중심으로 아래위 온도가 비슷하게 돼 묵이 끈끈하지 않고 매끈해진단다.
황포(黃泡)묵도 좀 특별한 묵이다. 치자를 갖고 청포묵에 노란 물을 들인 게 묵이다. 특히 전주비빔밥에는 반드시 이 묵이 올라가야 된다. 제독(除毒) 효과가 있어 전주비빔밥 전문점에서는 여름철에는 특히 이 묵을 빠트리지 않는다.
◆기타 오지권의 묵
경북 북부권은 강원도 오지권과 맞물려 있다. 거기의 가장 독특한 묵이 바로 국수 같은 '올챙이묵'. 옥수수 가루 앙금을 끓인 전분액을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바가지에 부으면 구멍을 통해 찬물로 흘러내린 묵발의 생김새가 꼭 올챙이 같아 붙여진 명칭이다. 일명 '옥수수묵'이라 한다.
만드는 법은 이렇다. 덜 여문 옥수수를 골라 알알이 따서 맷돌에 곱게 간 다음 갈아놓은 옥수수에 물을 부어가면서 고운 체에 밭쳐서 앙금(옥수수 녹말)을 얻는다. 이때 웃물을 따라버리고 앙금에 새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된죽을 쑨다. 그릇에 냉수를 떠넣고 구멍 뚫린 바가지에 죽을 붓고 누르면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옥수수묵이 냉수 속으로 떨어진다. 떨어진 올챙이묵을 건져내어 그릇에 담고 식성대로 양념장을 섞어서 먹으면 매끈하고 시원하며 맛이 구수하여 여름철의 별미음식이다. 이 묵이 충북 단양과 경북 북부권으로 오면서 '메밀올챙이묵'이 된다. 흡사 안동의 '건진국수'를 연상시킨다.
wind309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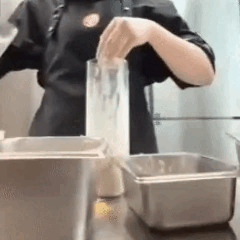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단독] 정부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