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학원생이던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평론가였던 학과장 교수님과 학교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8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을 살았어도 적응하지 못했던 대구의 여름 날씨인데 뜨겁고 칼칼한 김치찌개로 내장 속을 그득 채워놓은 채 그늘 한 조각 없는 대로의 뙤약볕 아래 서 있었으니 우리 얼굴은 벌겋게 상기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대프리카보다 제 뜨거움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요."
숨 막히는 더위를 헤집고 농담 반으로 내뱉은 내 말에, 수업에서든 사석에서든 진지함을 장착하고 살아가던 선생님이 한참 뜸을 들인 후 대답했다.
"너의 그 뜨거움이, 언젠가는 글을 쓸 때 엄청난 원동력으로 되어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30대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청춘의 대낮에 꼿꼿이 서서 질식할 것 같다고 느끼던 날, 당신의 말을 되뇌며 생각했다. 그날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선생님.
5월이 오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스승이 소환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을 지나며 뜨거웠던 여름날을 떠올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꽃과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 기념일은 핑계 대기 딱 좋아요. 평소 못했던 말들 전부 풀어놓기 위해서요. 넓은 세상에서 선생님과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글'이란 점을 사랑하고 있어요."
평소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았던 아이의, 새벽녘 갈겨썼을 것 같은 자잘한 글씨를 보는 순간 대프리카의 8차선 대로 앞에서 나의 스승이 흘렸던 땀방울처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버렸다. 그때 나의 선생님도, 이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지금의 내 마음으로 김치찌개를 사주고 또 진심 어린 좌표 같은 말을 해주셨던 거겠지.
그때보다 육체는 늙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한낮처럼 뜨겁다. 그래도 이제는 그 뜨거움을 방황 대신 글자로 풀어낼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말이 다 맞았다. 누구나 겪는 인간 본연의 절대 고독 같은 감정일지라도, 글 쓰는 이에게는 매 순간 습자지처럼 더 예민하고 또 선연하거나 섬뜩하게 감지 된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나의 스승은 조용하고 느린 당신만의 언어로 격려해 준 것이었다. 난 이제 그의 말을 눈물처럼 받아들인다.
돌아서면 대구는 또 아프리카를 방불케 하는 찜통의 계절이다. 지금 내 곁에는, 20대의 나보다도 더 벼린 날의 감정선을 가진 아이들이 매일 밤 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미안하지만, 가엾지 않다. 글 쓰는 자에게 그런 뒤틀림은 당연한 것이고 더 심해도 괜찮다. 그건 좌표의 방향 같은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을 선생님의 마음이 촉수가 되어 나의 어여쁜 아이들에게로 향해갔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안다면 내 예상에 딱 한 마디 하셨을 것 같다. 다행이야, 라고.
선생님이 무척 보고 싶은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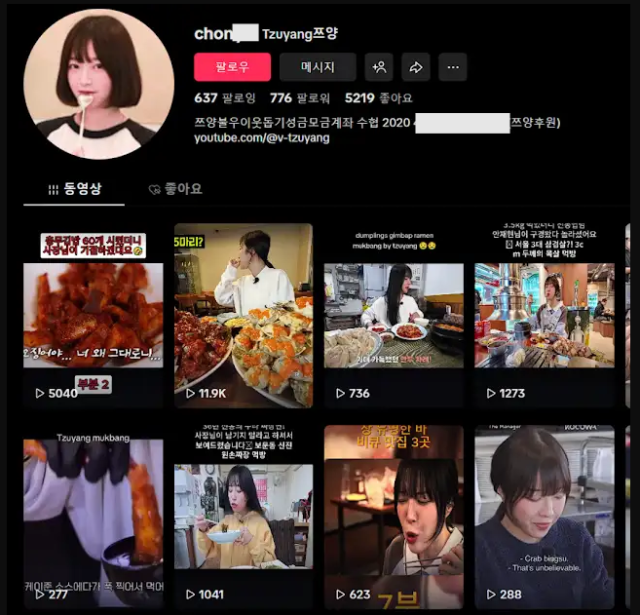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