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마산](https://www.imaeil.com/photos/2025/05/15/2025051511141665675_l.jpg)
1960년 3.15의거의 중심이었고, 79년 부마항쟁과 87년 6월항쟁 등, 한국현대사의 큰 사건을 온몸으로 맞아온 도시. 1970년대 섬유산업 융성으로 부흥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의 그림자 또한 짙었으며, 2020년대 관광산업에 기대어 마지막 안간힘을 쓰던 자영업자를 쓰러뜨린 팬데믹의 유탄이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공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마산이다.
한편 내가 아는 마산은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로 시작하는 가곡 '가고파'와 수출자유공단과 아귀찜이 전부다.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울컥했다. 나고 자란 곳을 떠나와 웬만한 나이가 된 이들에게 고향을 떠올려 보라고, 더 늦기 전에 한 번 다녀오라고 슬며시 독려하는 듯했다. 하물며 진해와 함께 창원 시로 편입되면서 고향이 사라진 마산 사람임에랴.
'모나코'에서 자존감 높고 부유한 노인의 욕망을 세밀화로 그려낸 김기창은 한때 경제개발의 주역이었으나 시대 흐름에 밀려난 도시, 자신의 고향 마산을 선택한다. "처음부터 고향을 사랑하긴 어렵다. 마산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마산을 떠나 산 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사랑한 적 없는 나의 도시'에 대해 마음이 생겼다."는 작가의 말처럼, 장편소설 '마산'은 마산을 배경으로 얽히고설킨 인물들이 마주하거나 외면하는 동안 펼쳐지는 운명 같은 삶의 기록이다.
소설 속 마산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를테면 1974년 동미에게 "어선에서 화물선으로,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공산품이 바다의 선물이" 된 지역이었다면, 1999년 준구에겐 "이왕이면 근사한 미래를 훔치"려고 대마초를 키우기 적합한 공간이고, 2021년의 은재와 태웅은 "자신의 삶 역시 한번 부풀어 보지도 못한 채 수그러들기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점점 낡아가는 도시가 마산이었다.
'마산'은 3세대 50년을 넘나들며 한때의 영광이 소멸하는 도시를 비감어린 정조로 묘사하면서 동미와 준구와 은재와 태웅에게 각 시대의 슬픔과 고독을 입혀놓는다. 적당히 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현실은 재단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니 환경에 맞춰 몸을 줄이거나 늘릴 수밖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라던 중소기업 총괄이사 말에, 어쩌면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이 이곳이라고 은재가 푸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먹으면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1974년의 동미와 2021년 은재 사이에는 아예 다른 세상이 놓인 셈이었다.
흥미롭게도 김기창은 산업화의 어둡고 가파른 장면들을 묘사하다가 끝내 체념하며 속내를 보인다. 예컨대 IMF를 거치면서 도시의 지형도를 바꾼(섬유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결정을 "곳간이 거덜 난 곳에서 벌어진 축제"라고 말하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휘청대고 말았으니 2021년의 청춘이 마산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을까? 오죽하면 각 세대의 인물들 입에서 어김없이 터져 나온 말이 "도둑질이 그나마 낫지 않아요?"였을까.

"한 개인의 운명이란 따지고 보면 한 개인의 운명만은 아니라는" 준구의 말. 사람의 일이란 게 오로지 그 일만 단독으로 벌어지지 않는 법이다. 알고 보면 개인을 둘러싼 무수한 관계와 환경이 촘촘하게 개입됐다는 얘기. 그리하여 각기 다른 시간을 살던 인물들을 한곳에 불러 모으는 작가 김기창이다. 왜 아니겠나, 시대와 환경은 변했어도 모두의 공통경험이 스민 고향, 마산이거늘.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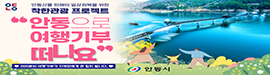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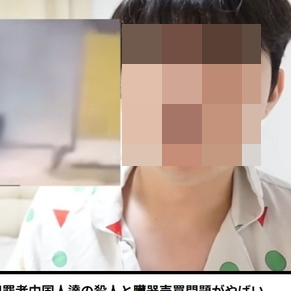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들에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최선"
가덕도 입찰 재개하는데…대구경북신공항 운명은?
한라산에서도 중국인 대변 테러…"하산하다 토할 뻔"
"尹,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서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테이블마다 '소폭'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