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도 자산(資産)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여력(餘力)이 있어야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돈을 빌릴 수 있다. 국가 역시 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한도가 결정된다. 경제가 엉망이면 국채를 사 주지 않아서, 즉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이 10%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GDP의 2배 이상 빚을 진 나라도 있다. 최빈국은 국채 발행 능력이 없어 빚도 적다. 그러나 미국, 일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돼 적은 이자(국채 수익률)를 주는데도 인기가 높다. 국채는 외환 유동성과도 밀접하다. 달러 보유고가 넉넉하거나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면 국채 비율이 높아도 버티지만 반대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달러를 사올 때를 떠올리면 된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대한제국 경제를 예속(隷屬)시키고자 일제는 고리(高利)의 차관(借款)을 강제로 들여오게 했다. 당시 국채가 대한제국 1년 전체 세입과 맞먹는 1천300만원이었다. 운동을 주창한 서상돈은 "2천만 동포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매월 1명당 20전씩 모은다면, 3개월 만에 국채를 다 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우리나라도 걱정스럽다. 지난해 국채는 1천175조2천억원, GDP 대비 비율은 46.1%였다. 2016∼2018년 600조원대에서 2배가량 늘었고, 채무 비율도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50년 국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하다.
나라 살림도 적자인데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빚을 더 내야 한다. 6·3 대선 후보들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앙(災殃)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금 국채보상운동을 편다면 5천만 국민이 2천350만원씩 내야 한다. 돈 빌린 사람 기준 1인당 1억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3월 말 1천930조원 기준)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ksy@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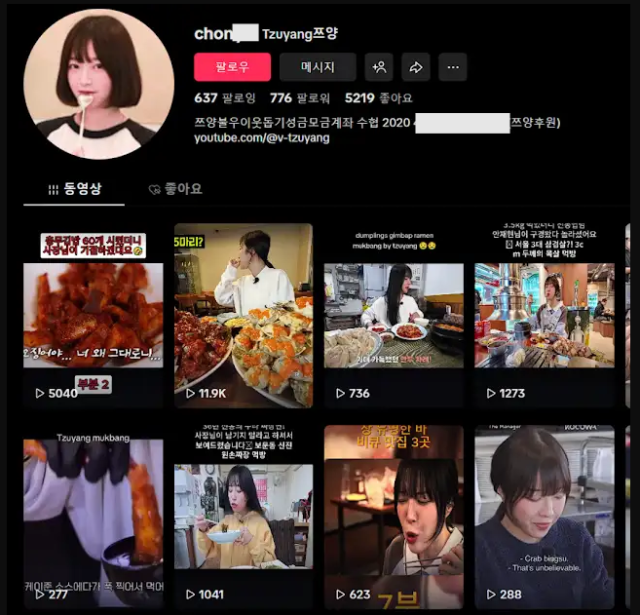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