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과의 여행은 늘 고단함을 동반한다. 젖병과 기저귀, 옷가지며 이불까지 한가득 싼 짐을 안고도 작은 생명체를 데리고 들로 산으로 향하던 기억은,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아이가 말문을 트기도 전부터 낯선 바다에서 발끝으로 물장구치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든 기억으로 붙잡고 싶었다.
지금 물어보면 정작 아이는 기억조차 못하는 여행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은 장면들이다. 아이의 첫 기차 여행, 뜨는 해를 처음 본 겨울여행, 비에 젖은 신발을 말리던 그 저녁. 이렇듯 여행은 어쩌면 아이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한 탈출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굳이 떠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특히 부모가 된 지금,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던 내 부모의 발걸음이 새삼 존경스럽다. 휴대폰 내비게이션도, 숙소 후기 앱도 없던 시절, 어떻게 길을 찾고 어디서 잠을 청했을까. 이제 와 돌이켜보면, 부모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무모함과 용기의 다른 말인 듯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나는 굳이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는다. 비록 아이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와의 따뜻한 시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던 그 감각,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그 거리의 체온은 기억의 깊은 곳 어딘가에 새겨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른이 된 지금 나와 나의 부모를 이어주는 것은 사진보다 그 '조각의 기억'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이제는 나와 내 아이를 이어주고 있다. 그 시절의 부모님들처럼, 나 역시 지금 아이와 함께 짧은 틈을 내어 떠나보려 애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짐을 싸는 일도,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도,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우리 그때 바다 갔을 때 좋았지?" 하고 말을 꺼낼 때면, 그 모든 수고로움이 단숨에 선물처럼 느껴진다.
한 번 여행을 다녀온 기억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언어처럼 남아 같은 이야기를 오래도록 꺼내 말한다. "그때 치타입니다, 기억나?" "그 맛집 아직도 있을까?" 작은 여행 하나가 가족 간 대화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어 견고한 유대감을 지켜준다.
물론 모든 가족이 자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상황도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약간의 틈을 낸 작은 외출 하나로도 그 끈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여행의 본질은 '멀리'가 아닌 '함께'에 있으니 말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은 이런 순간들을 통해 자라난다. 그렇게 가족의 기억은 겹겹이 쌓여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서로를 부른다. 떠날 수 있을 때,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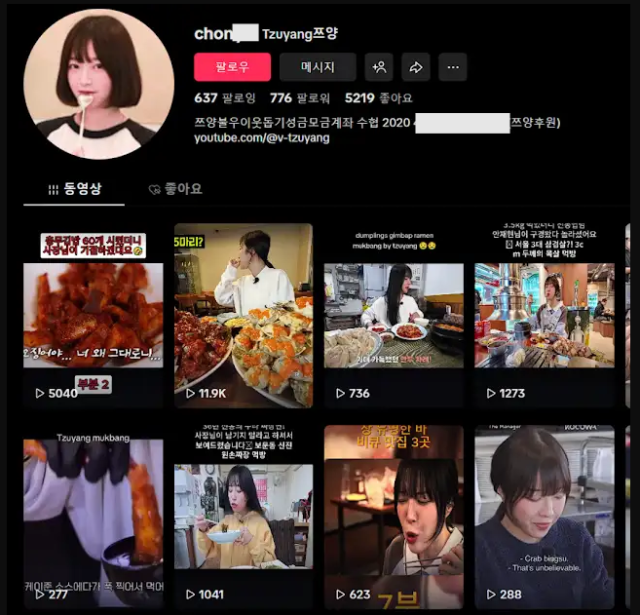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