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부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응원의 말보다는 "왜요?"라는 질문이 더 많았다. 안정적인 직장, 매달 꽂히는 월급, 정년이 보장된 자리. 음악을 전공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서 나는 점점 음악과 멀어지고 있었다. 연주는 이어졌지만 마음속의 음악은 희미해져 갔다. 결국 나는 퇴사를 선택했다.
프리랜서 음악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다.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동료 음악가들과 앙상블을 꾸리고, 홀이나 갤러리, 때로는 바닷가 모래 위에서도 연주했다. 햇살과 바람, 사람과 음악이 섞인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질수록 음악은 더 진하게 전해졌고, 내 음악도 살아 있는 듯했다. 음악은 화려한 조명 아래만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 곁, 삶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공연은 이어졌지만 무대를 유지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다. 예술인 지원 사업은 줄어들고, 며칠을 들여 준비한 서류는 연이어 탈락했다. 어렵게 선정돼도 예산은 깎이기 일쑤였다.
결국 나를 포함한 동료 음악가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공연을 이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음악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계는 더 힘들어졌다. 문득 내 안에 다시 먹먹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음악을 멈출 수 없었기에 안정적인 자리를 떠났지만, 이제는 안다. 음악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음악을 지켜낼 예산이라는 것을. 국공립 단체에 속해 있을 때는 예술가로 보호받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모든 것이 개인의 몫이 됐다.
창작은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불안정해졌다. 무대 위의 예술보다 무대 밖의 행정력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둘, 예산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지역 예술가가 버티지 못한다면, 지역의 문화는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문화도시', '음악 창의도시'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 도시에 살아가는 예술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예술가는 단지 무대 위의 존재가 아니다. 학교로, 마을로, 병원과 거리로 찾아가는 이들이다. 음악은 단절된 이들을 잇고, 예술은 무언가를 잃은 이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 역할은 통계로 환산되지 않지만, 도시를 살리는 진짜 힘이 거기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한 명의 음악가가 묵묵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돈, 마음을 들여 관객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이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다.
예술가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다. 문화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한 기본이다. 지원은 특혜가 아닌, 예술가가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숨 쉴 틈이다. 예술가가 머무를 수 있어야 예술도 머물 수 있다. 쉼 없는 연습에 쉼 없는 지원을. 그것이 진짜 문화도시의 시작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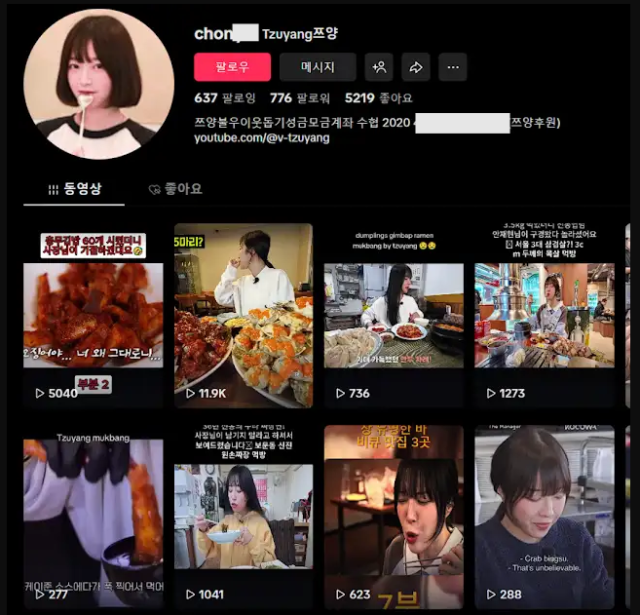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