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학사에서 파격적인 작품세계로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작가 이상(李箱·본명 金海卿 1910~1937).
올해 그의 60주기를 맞아 요절한 천재작가에 대한 평단의 재조명작업이 활발하다. '문학사상'등각 문예지들은 최근호에 이상 60주기 기념논문을 싣는등 이상특집을 게재,여전히 해독할 수 없는의문부호로 남아있는 이상문학(李箱文學)과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온갖기행(奇行)과 철저한 자의식등 비정상으로 자리매김돼온 그의 짧은 삶에 대한 평가는 80년대후반이후 조금씩 그 신화적 요소와 허상이 걷혀지면서 그의 문학본질에 대한 정립의 목소리가 높아진것.
문학평론가 김윤식씨는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이상이 1930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실은 처녀작 '12월12일'을 비롯 '봉별기' '오감도' '종생기'등 작품전편에서 그가 가족및 개인사적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문학)에 매달렸다고 분석했다. 그가 본질적이고 치명적인자살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기록을 선택했다는 것. 두살때 백부의 양자로 간 개인사적공포의 기록인 '12월12일'등 이상의 시, 수필, 아포리즘, 소설등 일체의 기록은 공포가 엄습해올때마다 이에 대응한 초극방식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단순히 무의식적인 기록과 전략적인 글쓰기 차원의 기록은 구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편소설로 보기 힘든 자전기 '12월12일'에서부터 '오감도'등은 소설로 향한 중간단계의 글쓰기라는게 김씨의 평가다. 36년, 37년에 잇따라 발표한 '날개' '봉별기'와 유작인 '종생기'등 단편소설은 이상의 기록이 단순히 개인사에서 벗어나 소설의 장르로 옮겨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허무(죽음)를 초극하는 문학으로 일반화됐다고 풀이했다.
이처럼 우리문학사에서 이상은 "기이한 문학, 난해한 텍스트로 남은채 천재적인 신격화만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는게 평론계의 시각. 이번 60주기를 계기로 진정한 이상문학의 자리매김은 보다 체계화된 연구와 엄정한 재조명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徐琮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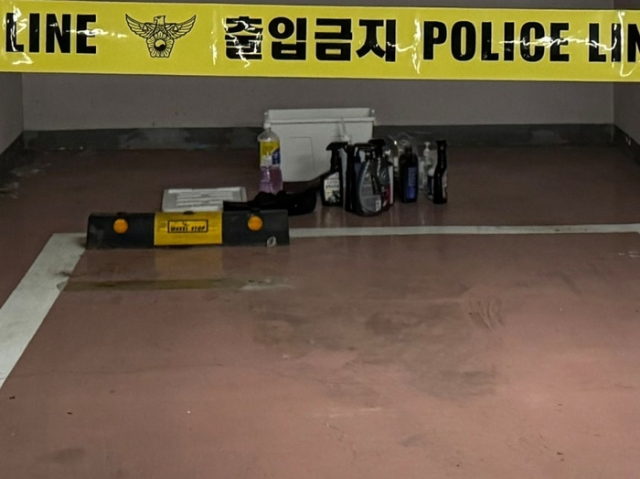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