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바람이 불면 에로비디오가 잘 나간다.
그러나 최근들어 에로영화('젖소부인' 16㎜비디오영화는 준포르노)의 제작이 눈에 띄게 줄었다.80년대 한때를 '풍미'한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식 토속 에로영화도 생명을 다했고 '무릎과 무릎사이'식 사회성 에로영화도 끝을 봤다.
에로영화는 단순히 얼굴을 붉히면서 볼 영화가 아니다. 이명세감독은 "사회 비판 코드로 에로영화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에로비디오를 보면 사회가 보인다'.
현재 비디오가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에로영화는 몇가지로 나눌수 있다. 우선 말초자극 영화들. 육체적 에로영화로 대표적인것이 '애마부인'시리즈다. 그 다음이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변강쇠''변금련'등 토속에로영화. 또 하나가 바로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에로영화다.임권택 이장호 정지영등 쟁쟁한 중견감독들은 모두 에로영화를 만들었다. 이장호감독의 '무릎과무릎사이'(84년)는 대단한 화제를 모은 작품. 한 여대생이 거듭된 성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는다는 줄거리는 겉으로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강간이란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앞둔 정부의 국내 잡도리가 심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처가 컸다는 사회비판적인 시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또 '어우동'(85년)도 폐쇄적인 제도와 윤리속에 억압받는 여인이 남성위주의 윤리에 정면으로 대결한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엿보였다. 무인들의 호위속에 어우동이 임금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은국가원수를 비유할수 있다고 해서 개봉 이후 다시 잘라내 말썽을 빚기도 했다.유진선감독 '매춘'(88년)의 마지막 장면은 콜걸들의 사회비판이 절정을 이뤘다. 죽은 콜걸의 뼈가루를 들고 변심한 남자의 결혼식장을 쳐들어가 매춘을 키우는 사회를 비판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신들의 처지를 토로했다. 그러나 '매춘'은 지나치게 생생한 성묘사로 사회 비판의 의도가 많이 가려졌다.
장선우감독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고립되고 권태로운 일상적인인간들의 고민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무거운 영화다. 장선우감독은 "해체된 현대사회의 가치 도덕을 비판하는 틀로 공격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권택감독의 '창'도 형식과 내용을 봐서는 에로영화지만 현실반영이란 측면에선 다소 실망스럽다.
에로영화의 사양길은 비디오가를 주름잡고 있는 '얄궂은' 준 포르노에 밀린 탓이 크다. 그러나 한영화평론가는 "에로영화를 못 만드는 것은 사회를 비판할 능력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金重基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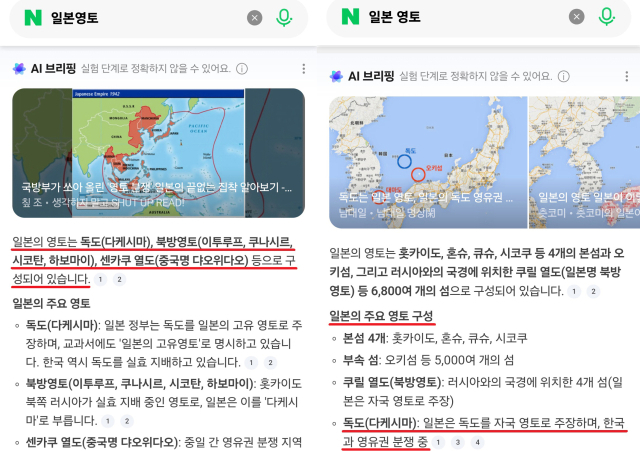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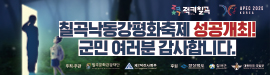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