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호소할 것이 못 된다. '소유'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 소유-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에 대해 "백만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 허용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은 소유고, 만일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교사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그들이 각기 제시한 체계의 중심 문제로 삼아왔다. 붓다는 인간 발달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계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망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누가복음 9:24∼25).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 독일의 신학자.신비주의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공허'하게 하는 것, 자신의 자아(ego)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 부(富)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가르쳤다. 마르크스는 사치는 가난에 못지 않게 나쁘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내가 여기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급진적인 휴머니스트로서의 진짜 마르크스이지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그려내고 있는 속악(俗惡)한 가짜 마르크스가 아니다).
삶에서의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고(故) 스즈키 다이세스가 '선(禪) 에 관한 강의'에서 언급한 비슷한 내용을 지닌 두 편의 시를 실례로 들겠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쇼(1644∼1694)의 하이쿠(俳句)이며, 또 하나는 19세기의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산책 중에 본 꽃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기술하고 있다. 테니슨의 시는 다음과 같다.
갈라진 암벽에 피는 꽃이여/나는 그대를 갈라진 틈에서 따 낸다./나는 그대를 이처럼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다./작은 꽃이여-그대가 무엇인지./뿌리뿐만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그 때 나는 신이 무엇이며/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바쇼의 하이쿠를 옮기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자세히 살펴보니/냉이꽃이 피어 있네/울타리 밑에!
이 두 시의 차이는 현저하다. 테니슨은 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 낸다'. 그리고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이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지적(知的) 명상으로 시를 끝맺고 있지만 꽃 자체는 꽃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서 생명을 빼앗긴다. 우리가 이 시에서 보는 테니슨은 살아 있는 것을 해체하여 진리를 찾으려는 서구(西歐)의 과학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쇼의 꽃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 그는 꽃을 따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꽃에다 손을 대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뿐이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에서
◈생각하기
소유양식이 아닌 존재양식을 중시하는 삶을 위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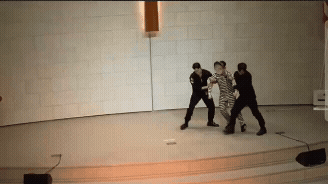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르포] 구미 '기획 부도' 의혹 A사 회생?…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韓 소명 부족했고, 사과하면 끝날 일"…국힘 의총서 "당사자 결자해지"
홍준표, 당내 인사들에 "정치 쓰레기" 원색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