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지 못하는 등 이틀째 파행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안 의원의 사과 및 국회 속기록 삭제를 거듭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 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에 난항을 거듭했다.
이상수 총무는 "안 의원 발언은 반국가적 망언이며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재오 총무는 "속기록 삭제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도 이날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국민을 대변해 한 말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과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대정부질문에서 색깔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더욱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 한나라당측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 의원에 대해선 국회윤리위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광옥 대표는 "의회정치의 본산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면서 "면책특권을 악용,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를 왜곡하고 음해하는 작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누구도 비판해선 안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용호 게이트' 등이 불거지니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는 10일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으나 국군의 날 치사에서 6.25를 통일시도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발언에 민주당 측이 강력 반발, 국회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음으로써 영수회담 개최 하루만에 정치권은 대치국면에 빠졌다.
0...안 의원은 파문 하루 뒤인 1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나라를 걱정하면서 여러날 고심한 끝에 이같은 지적을 하기로 결심했던 만큼 여당의 사과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속기록 삭제 요구와 관련해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이만섭 국회의장의 간곡한 권유도 있어 발언중 일부를 수정할 용의가 있으나 자진사퇴 등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망언'을 '발언'으로 고치는 등 일부 용어에 한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0...민주당은 이에 앞서 10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안 의원 발언에 대해 "이회창식 테러정치의 전형" "대통령과 국군,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라는 등으로 강력 성토하면서 정부답변을 듣기 위한 본회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상수 총무는 "대통령 발언을 확대.왜곡해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말로 모독했다"며 "영수회담에서 이 총재도 대화와 타협으로 동반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뒤통수를 치는 발언을 했다"고 격분했다.
0...그러나 이재오 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만섭 의장을 면담, "안 의원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이의를 달지않다가 오후에 문제삼고 나선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권위 보호차원에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속기록을 수정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당 총무가 접촉, 타협을 모색했으나 민주당이 이 총재 및 안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속기록 수정만 응할 수 있다고 밝혀 결렬됐다.
0...한나라당도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공전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 진정 반성하는 태도가 여당다운 자세"라고 맞서면서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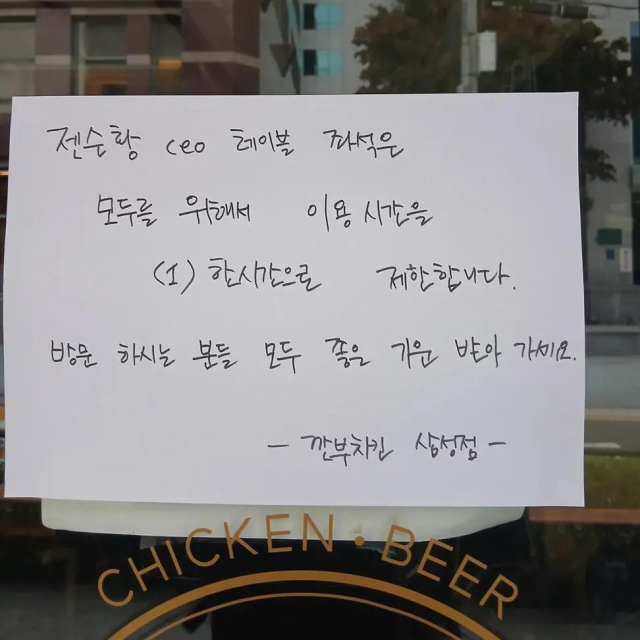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