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賞)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드물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만큼 상에 집착하는 국민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상장을 받는 것으로 출발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상장의 종류도 워낙 많아 웬만한 학생은 자기가 받은 상을 기억하지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집착은 성인이 될수록 더욱 강해진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6년도훈.포장과 표창자가 1만9천702명이었는데 99년에는 5만3천298명으로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무엇이든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 타의 모범이 되고 자기 계발의 채찍질로 받아들여져야 할 상이 이렇게 지천으로 널브러지면 '하향 평준화'를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상은 지구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왕립 스웨덴 과학원은 9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노벨 화학상.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바야흐로 노벨상 시즌이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노벨상 수상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올해는 노벨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년같지 않은 것 같다. 한번 타고 나면 심드렁해지는 게 상이지만 올해는 수상자 중 우리와 각별한 관계를 가진 학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중 한명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다. 그는 한국과 특히 친근한 인물이다.
▲98년 세계은행(IBRD) 수석부총재 시절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고금리 정책을 적용한 데 대해 "한국의 위기는 재정적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 데도 중남미에 적용했던 고금리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위축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다 결국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에서 밀려났지만 우리나라의논리를 대변해준 학자로 비굴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학문적 양심을 지킨 그의 용기가 새삼 돋보인다. 지난 7월에는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학에서 동부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으로 옮기는 게 미국 언론에 크게 소개될 정도로 권위를 쌓았다.
▲그러나 아무리 권위있는 노벨상이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도 6명이나 된다. 73년 키신저와 함께 평화상 수상자로 지명된 베트남의 레둑토는 아직 조국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이유로 수상을 거부했다. 특히 평화상은 그 업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속성 때문에 수상때마다 뒷말이 많다. 따라서 평화상은 상을 받는 것보다 그 권위에 걸맞은 사후관리가 더 어렵다고 한다. 21세기 첫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는 누가 평화상을 타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윤주태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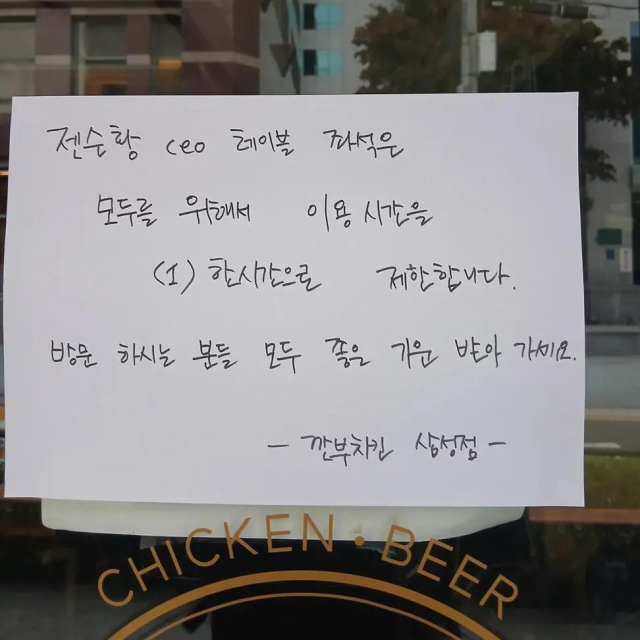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