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구벌의 뿌리는 달성(達城), 그 주인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달성이 달구벌의 원류라면, 그 뿌리를 근거로 활동했던 달구벌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경북문화재연구원 윤용진(전 경북대 교수) 원장은 "대구의 고대 원(原) 선조들은 서구 비산동, 내당동 일대에 묻혀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대구시 중구 달성동 달성의 바로 남서쪽인 서구 비산4동, 내당2.3동 일대에는 200~500년대 대구 중심세력의 지배층 무덤 87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른바 '달성고분군'이다.
일제시대 봉토(峯土)가 확인된 무덤만 이 정도이니 논밭 경작이나 개발 등으로 봉토가 사라진 무덤까지 포함하면 100기는 족히 넘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분군은 언제 어떻게 형성됐을까.
---지배층 추정 무덤 87기 분포
대구 달서천 지류가 북쪽으로 둘러싼 달성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뻗은 낮은 구릉에 위치한 달성고분군. 달성은 대구분지의 중심에 자리잡아 사방으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고분군은 현재 달성공원 남서쪽의 대성초교와 제일고 일대(비산동)에서 새길시장 일대(내당동)까지 약 2km 구간에 분포해 있는 셈이다.
일제시대인 1923년, 현 서문시장 터에 있던 저수지인 '천왕당지(天王堂池)를 메워 재래시장을 개설하면서 달성고분군의 실체가 드러났다.
저수지 매립에 사용된 흙이 바로 비산동, 내당동 일대 무덤의 봉토였고, 이 과정에서 고분군이 확인됐던 것. 비산동, 내당동 경계지역 무덤 8기는 이 때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나온 유물은 토기 157점, 무기 및 말장구 80점, 철제용기 3점, 옥 1점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덤 87기중 7기(34, 37, 50, 51, 59, 62호)를 발굴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37호 무덤에서 금동관 2점이 출토된 것을 비롯해 토기, 철기, 금속 장신구 등 유물 수백 점이 쏟아졌다.
이로써 대구의 원류, 달구벌국(達句伐國)의 베일이 벗겨진 것이다.
---금동관등 유물 수백점 출토
이후 지난 98년 5월, 경북대박물관은 서구 비산4동 200의 82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였다.
소방도로를 뚫던 중 토기조각들이 나왔다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사를 통해 200년대 중반부터 300년대 초반에 걸쳐 쌓은 흙무덤(土壙墓) 3기와 돌널무덤(石槨墓) 2기 등 고분 5기를 확인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완전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던 달성고분군이 70여년 만에 조사됨으로써 그 역사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99년 11월에는 영남대박물관이 경북대박물관이 조사한 소방도로 인접지역인 비산4동 202의 1 23평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나무널무덤(木槨墓) 2기와 돌널무덤 3기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조사를 통해 달성고분군이 지배계급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관묘 단계부터 형성된 집단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은 무덤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달구벌 터전 보존대책 필요
김대환 당시 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은 "달성고분군은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500년대 전반까지 이 지역 최고집단이 쌓은 친족집단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제와 지역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달성은 200~300년대 달구벌국의 거점이었고, 이와 연결된 달성고분군은 바로 그 주축 세력의 무덤으로 나타났다.
결국 달성고분군 일대는 청동기시대 이후 대구의 선조들이 터를 닦고 성을 쌓아 생활하던 근거지이자, 지배층이 묻힌 곳이다.
그러나 재개발 등 개발 논리에 밀려 귀중한 문화유적지가 훼손되고 시민들로부터 잊혀져가고 있다.
달구벌의 터전을 보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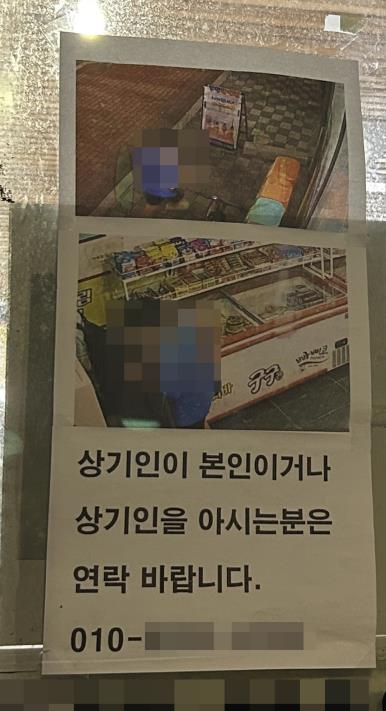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