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같으면 입춘절식(立春節食)으로 햇나물 무침을 즐겼을 봄의 길목이다. 나이 탓인가, 시장기는 있건만 입맛이 나지 않아 수저를 들까말까 망설여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소년시절에 먹었던 음식 맛이 그리워진다.
지금도 미각의 기억을 생생하게 자아내는 음식들. 이른 봄 파잎 무침과 무순 그리고 된장에 담근 풋고추 등등……. 겨우내 구덩이 속에 갈무리된 무에서 난 연두색 새순을 잘라서 무친 것이야말로 봄의 향취를 담뿍 지닌 입춘절식에 다름 아니었다.
된장 속에서 노르스레하게 익은 풋고추는 반찬으로 그만이었다. 고추를 깨물었을 때 입안 가득 번지는 짭조름한 물은 식욕을 돋우는 촉진제였다.
여름철에 점심으로 자주 먹은 것은 칼국수와 수제비였다. 삼베옷을 입은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물이 끊는 솥에다 뚝뚝 떼 넣어 만든 수제비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머니는 열무김치를 잘 담그고 풋고추로 반찬을 많이 만들었다. 가는 댓가지에 약이 오른 풋고추를 나란히 꿰어 삭정이 탄불에 한번 얇게 굽고 그 위에다 간장에 버무린 밀가루를 발라서 다시 굽는 고추 적이 미각을 끌었다.
별 반찬이 없을 때에는 풋고추를 듬성듬성 분질러 넣은 된장을 보리밥에 비벼서 먹어도 맛이 좋았다. 식구들끼리 살평상에 둘러앉아 콧물을 훌쩍이며 단숨에 먹어치우던 보리밥이 이제는 건강식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으니 격세지감이다.
된장 단지에다 뜨물을 붓고 멸치와 풋고추를 썰어 넣고 삭정이 탄불에 보글보글 끓여 만든 된장 맛은 영원한 고향의 미각이다. 여름철이면 천렵으로 잡은 물고기로 토란과 파, 마늘 등 양념을 넣은 어탕을 끓여 청량한 냇가에 앉아 이밥을 말아 먹던 달고 단 맛을 어찌 필설(筆舌)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가을철 음식 중에는 어머니가 무잎을 삶아 잘게 썰어서 양념에 무친 나물 반찬이 기억에 남는다. 메뚜기를 잡아 참기름에 볶은 것도 상찬(上饌)의 하나였다. 동생과 메뚜기를 잡으려고 저문 가을 들판을 헤매었던 추억과 함께 향수처럼 아련한 맛이라고 할까.
늦가을이면 어머니는 나박김치를 만들었다. 김장 무를 뽑고 나서 허드레 무를 잎사귀째 식칼로 또닥또닥 난도질해서 만들던 나박김치는 소슬하고 구수한 가을들녘 같은 맛을 지녔었다.
겨울철은 별다른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가을에 갈무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슥한 겨울밤 눈이라도 내릴 적에 메밀묵을 쳐먹던 그 맛이며, 얼음 조각 속에서 건져낸 동치미 맛은 겨우내 알뜰한 체온으로 남아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요리책을 통해 익힌 것도 아니요, 요리강습소에서 배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린 내가 보아도 그래 가지고서야 무슨 맛이 날까 싶었는데, 듬성듬성 채소를 썰어 버럭버럭 이기거나 꾹꾹 눌러 모양새도 없이 그릇에 담아낸 음식이 어떤 고급요리보다도 맛깔스러웠다.
지금껏 일류 음식점에서 고량진미에다 진수성찬을 다 접해 보았지만 빛깔이 호화롭고 미미(美味)롭기는 하나 뒷맛이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었던 음식들은 오늘날까지 그리운 맛으로 남아 이렇게 입춘 미각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조석(朝夕)으로 대하는 식단에 생선과 고기가 자주 놓인다한들 식욕이 동반하지 않으니 영양가가 무슨 보람인가. 이럴 때는 그저 잃어버린 식욕의 현재가 서럽기도 하다. 입춘절식마저 무색한 음식 맛을 앗아가 버린 비정한 세월의 흐름이여.
도광의(시인'전 대구문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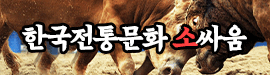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