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어와 도다리.
시인 장옥관(51)씨가 네 번째 시집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랜덤하우스 펴냄)를 냈다. 흥미로운 것은 시집 속의 '홍어'라는 시.
'.../그 속은 참 캄캄하겠다/썩어 문드러졌겠다 홍어, 수심 수백 미터 아래 어둡게 엎드려 사는 물고기/오직 견딤을 보호색으로 삼는 물고기/삼투압의 짜디짠 짠물이 몸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소금보다 짠 소태 오줌 채워 사는 법을 익혔다/...'
심해의 수압을 견디는 홍어의 끈질긴 생명력이 '퍼덕 퍼덕' 살아나는 시. '홍어'에는 '-문인수 시인의 시 '도다리'를 읽고'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도다리'는 후 내년에 나올 문 시인(61)의 시집에 수록될 시.
'.../큰 짐승의 발자국 같은 것이/뚜벅뚜벅 찍혀있다./바다의 저 끊임없는 시퍼런 활동이. 그 엄청난 수압이 느리게 자꾸 지나갔겠다./피멍 같다. 노숙의 저 굽은 등 안쪽의 상처는/상처의 눈은 그러니까 지독한 사시 아니겠느냐/...'
두 시 모두 육상으로의 솟구침, 또는 그 욕망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또한 시인의 시심(詩心)과 삶의 궤적도 잘 묻어난다.
그래서 '홍어'와 '도다리'를 놓고 두 시인이 만났다.
"속이 꽉 들어차 허점이 없어"라며 문 시인이 입을 뗐다. 삼투압마저 견뎌내는 저 지독한 '소태'를 말하는 것일까.
장 시인은 머릿속에 '문학'이란 글자만 들어 차 있던 70년대 '열혈 문학도'. 경북고 대륜고 등 10개교 학생들의 문학동인 '회귀선' 출신. "당시 대륜고에는 이성수, 양왕용, 예종숙 시인이 교사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국에 시인이 200여명 밖에 없었는데, 한 학교에 세 명의 시인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그러나 대학 4학년, 매일신문을 비롯한 신춘문예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시를 접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둔재 중에 둔재죠. 패배감이 엄습했습니다." 10년간 손을 놓았다. 그러나 시에 빠진 '골병'은 이미 고칠 수 없는 병. "하루 3~4시간만 자고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87년 마침내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다.
'.../그 무슨 무시무시한 생활이 짓눌렀을까 홍어, 바닥으로 바닥으로 슬픈 부채처럼 거친 발길 피해 숨어 산다/하지만 가끔 부챗살을 활짝 펼쳐 치솟을 때가 있다/온몸이 지느러미가 되는 순간이다/...'('홍어')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는 표제작을 비롯해 '청천의 유방' '부부' '달의 뒤편' 등 58편의 시가 4부로 나눠 실려 있다. 죽음과 성,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사유가 시에 녹아 있다. '꽃' '공기예찬' '산부인과에서' 등 일상의 사물과 사건마저도 성찰로 머리채를 잡는데, 시인의 고심과 깨달음이 홍어의 '그 독한 오줌맛!'처럼 진하게 다가온다.
"도다리의 터수가 바로 문인수죠."
도다리=문인수? 수족관 속에 바닥에 뚜벅뚜벅 찍혀 있는 큰 짐승의 발자국? 문 시인은 마흔 살에 등단했다. "그때야 등단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그냥 시가 좋아 쓸 뿐... ."
그는 1985년 '심상' 신인상을 받았고, 1996년 제14회 대구문학상, 2000년 제11회 김달진문학상, 2003 제3회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뿔' '홰치는 산' '동강의 높은 새'를 넘어 올해 '쉬'(문학동네 펴냄)로 이어지는 왕성한 시작(詩作)을 보여주고 있다.
시 '도다리'는 '바닥을 치면서 당장 솟구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들여다볼수록 침침하다. 내게도 억눌린 데가 그늘져/젖어 썩은 활엽처럼 천천히/떨어져 나가는, 가라앉는, 편승하는/저의가 있다/...'
문 시인은 "다시 답시(答詩)를 써야 겠는데"라고 했다. '또 어물이냐?'는 물음에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허기를 달래주는 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생명력에 대한 갈구를 '물고기 시'로 주고받은 두 시인. 육상을 탐하는 심해 생명체 '메갈로돈'을 떠올리게 한다.
김중기기자filmtong@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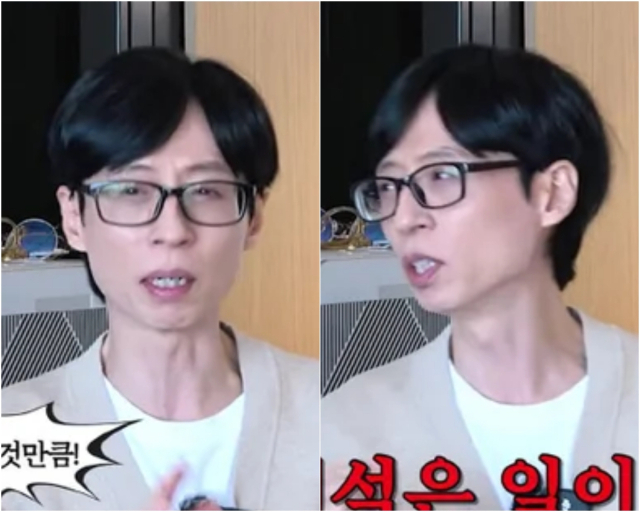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