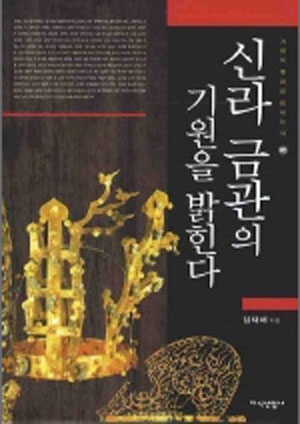
'우리(문화) 안에는 우리가 없다. 우리 겨레가 살았던 만주와 한반도에는 우리문화의 원형이 없다. 그래서 민족 문화의 원류를 한결같이 밖에서 찾는다. 시베리아에 없으면 알타이에서 찾고, 알타이에 없으면 몽골에서 찾고, 몽골에도 없으면 흉노에서 찾는다. 흉노에도 없으면 또 다른 북방 민족으로부터 연원을 찾아낸다. 북방에서 찾지 못하면 중앙아시아에서 찾고, 거기에도 없으면 남방에서 찾는다. 마침내 우리 문화의 남방 기원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중략) 신라 금관의 기원 연구도 꼭 그 짝이다. 신라는 금관왕국이라고 할 만큼 일정한 양식의 금관이 경주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는데도 금관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베리아의 철제무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있는 금관의 정체와 원형이 시베리아 초원 지역 샤먼의 모자에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그 결과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를 알타이족에서 찾는가 하면, 아예 신라왕을 무당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지은이 임재해 교수(안동대 민속학과)의 말이다.
이 책은 신라금관이 시베리아 샤먼의 모자에서 기원했다는 통설을 뒤집는다. 대신 신라 금관의 기원이 김알지 신화와 신라 왕권의 성립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지은이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금관은 모두 10여개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주에 집중돼 있다. 신라 금관과 견줄 만한 것은 흑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굴된 금관이나, 재료가 금이란 점을 가질 뿐 관모 양식은 아주 다르다"고 말한다. 경주에서는 순금왕관 6점과 같은 양식의 금동관도 20여 점 발굴됐다. 명실공히 신라는 세계적인 금관 종주국이자 금관 왕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시베리아 샤먼의 철제 무관에 신라 금관의 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시베리아 샤먼의 모자는 금관도 왕관도 아니다. 철제 모자이자 무당의 관모일 뿐이다. 이를 금관의 기원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를 의식한 탓인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혹은 흑해 주변의 금관에서 원류를 찾는 연구들이 이어진다. 그래서 틸리아 테페 금관이나 이씩 금관, 사르마트 금관이 신라 금관의 원류라며 새 전래설을 제기한다. 이 금관들 또한 재질의 동질성을 지닐 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전파론을 입증할 만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 관모의 양식부터 신라 금관과 다른데다가 역사적으로 40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신라 금관이 왕관이 아니라 조잡하게 만들어진 부장품으로서 주검의 얼굴을 가리는 데드마스크로 격하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지은이는 "21세기 한국학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들의 견해 속에 갇혀 맴돌고 있다"고 말한다.
책은 5세기 무렵 김알지 후손인 김씨 왕조에서 금관이 출현한 사실을 바탕으로, 김씨 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조 김알지 신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왕관을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금관의 세움 장식은 출(出)자나 사슴뿔 모양이 아니라, 모두 다양한 형태의 나무로서 곧 계림(鷄林)의 신수(神樹)를 형상화한 것이며, 금관을 장식한 나무 형상들은 김알지 신화의 무대인 '계림의 신성한 숲'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지은이는 "신라 금관의 기원을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찾는 학자들이 '굽은 줄기 곧은 가지' 모양 세움장식을 사슴뿔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슴뿔에 어째서 새 순을 상징하는 움과 나뭇잎, 태아 모양으로 달렸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신라 금관의 '굽은 줄기 곧은 가지 양식'은 가장 후기에 나타난 양식인데 그 양식을 근거로 시베리아 샤먼과 연결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결연하게 말한다.
이 책은 '겨레의 뿌리를 밝히는 책' 기획총서로 금관의 기원과 상징에 관한 독창적 해석은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학문적 대응을 위해 저술됐다.
700쪽, 3만5천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황교안과 비슷한 결말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