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콜린 헤이(Colin Hay) 지음/하상섭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21세기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갈수록 낮아지는 정치 참여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참여를 토대로 존속되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정권을 얻기 위해 유혈투쟁도 불사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자유, 공정, 공개 선거를 하게 된 것을 소중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정치참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무한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정치는 조금씩 일반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무관심을 넘어 정치혐오의 수준에 이르는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정치적'인 수사가 붙은 그 어떤 의미도 무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또는 그와 관련된 수사학적 용어를 '더럽다'(dirty)는 의미로 인식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콜린 헤이(Colin Hay) 교수는 이 문제를 그의 저서 『왜 우리는 정치를 싫어할까?(Why we hate politics?)』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정치를 집단선(collective good)이라고 전제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정치인 또는 관료들이 정치적 수단 또는 도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사실인가? 둘째, 유권자들이 정치를 사적 이익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오늘날의 정치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로 정치적 능력이 저하되었는가? 넷째,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왜 사회문제의 원인과 수준을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 선거나 공공행사 등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둘째, 시민들은 비공식적 또는 임시적인 정치행위에 얼마나 참여하며 스스로 그것이 정치적 활동이라고 인식하는가? 셋째,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가?
헤이 교수는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익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조사의 결과입니다. 다수보다 소수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응답이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에 의해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문항에서도 '많은 낭비', '약간 낭비' 응답자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90% 이상이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권자가 정치나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헤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참여정치 위기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정치공급자들 탓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치인, 공공관료, 정치적 실천가, 그리고 정치 분석가와 비평가를 포함하여 정치를 상품화시키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모든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콜린 헤이 교수의 분석은 비단 미국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OECD국가들 가운데 선거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의 순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번역을 하신 하상섭 교수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고된 번역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유권자들도 더 이상 매력 없고, 재미 없는 한국 정치에 식상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 주체들은 정치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동일(경북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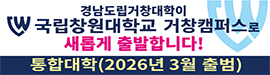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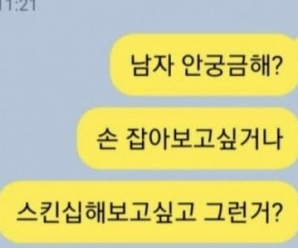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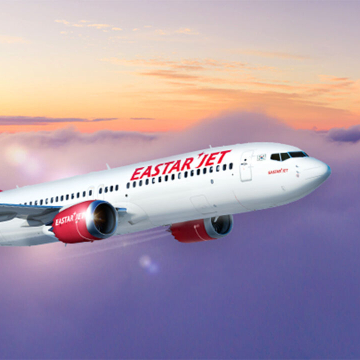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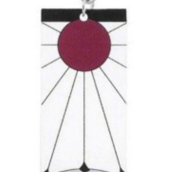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