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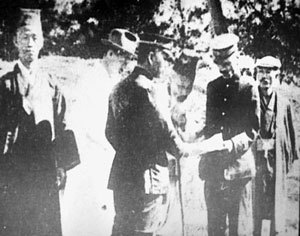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한국의 각종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 1914년의 지방관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1부 23군 272면 3천228동으로 바뀌었다. 도 행정은 도장관, 부윤(府尹), 군수, 면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대 경북도장관은 평안남도 관찰사를 지낸 이진호(李軫鎬)였다. 도장관은 칙임관(勅任官)으로서 총독에 직속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도장관은 아무런 권한없이 부하 직원인 일본인 부장(部長)의 감독을 받을 뿐이었다.
초대 대구부윤은 다케사키(竹崎六次郞)라는 일본인이었다. 부윤은 일본인의 자리였고 실권도 일본인에게 있었다. 청사는 현재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에 있던 대구이사청(大邱理事廳) 건물을 썼으나 곧 현재의 대구시청 자리로 신설하여 옮겨갔다. 부(府)의 초기 행정구역은 현재의 대봉동을 제외한 대구의 중구 대부분과 북구 칠성동을 포함하는 정도였다. 동수로는 52개였다. 도로와 도시구획을 비롯한 부의 모든 시설은 일본인 위주였다. 동 이름도 명치정(明治町·계산동)·동본정(東本町·교동)·팔운정(八雲町·수창동) 등과 같이 일본식으로 바뀌었다.
도내 각 군수도 일본인 서기(書記)의 감독 아래에서 아무런 결재권이 없었다. 군수도 초기에는 한국인 군수가 임명되었으나 점차 일본인 군수로 바뀌었다. 면장(面長)은 일본인의 이주 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과 그들의 사역에 관한 일을 할 뿐 자치 단체의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다.
헌병경찰통치 아래에서 대구헌병대는 충청·전라·경상도를 관할했다. 1914년 당시 도내에는 대구헌병대 본부 아래 분대 6, 분견소 5, 파견소 24, 출장소 32곳 등 모두 68곳에 헌병기구를 두고 있었다. 이곳에 배치된 병력은 장교 8, 준사관 1, 하사 58, 상등병 173, 헌병보조원 329명으로 총 569명이다. 이 수는 1910년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국인으로 채워졌다.
경찰기구로는 1914년 당시 경찰서 12, 주재소 61, 파출소 4곳 등 모두 78곳에 기구를 두었다. 경찰서장은 그 지역헌병대장이 겸임했다. 헌병은 경찰의 우위에 있었다. 배치 인력은 경무부장 1, 경시 2, 경부 21, 순사 199, 순사보 266명 등 모두 489명으로 일본인 196명, 한국인 293명이었다. 이는 1910년의 경찰기구 40개, 인원 수 47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기구는 크게 늘어났으나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여기서도 순사보는 전원 한국인이었다.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1914년 말 기준으로 37만여 가구에 187만여명이었다. 그 중 일본인이 6천300여 가구, 2만 1천여명이었다. 일본인 수는 전체 인구의 11.23% 정도였으나 해마다 늘어갔다. 경북도민은 도내 146여곳에 배치된 1천58명의 헌병과 경찰에 의해 온갖 고초를 겪었다.
헌병경찰이 범죄자라고 지목하면 한국인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체포를 당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했고, 자백만으로 죄가 됐다. 증인과 감정인에 이르기까지도 강박과 고문으로 그 범죄 사실을 위증하게 했다. 물품압수나 가택 수색도 소유자의 승낙이나 입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총독 직속인 경무총감의 명을 빙자한 헌병경찰은 한국인과 관련된 모든 직무에서 비도덕적이고 강압적이었을 뿐이다.
총독정치의 무단적 성격은 관리들의 복장에서도 잘 나타났다. 통감부시대에도 일부 관리들에게 제복을 입게 했으나, 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모든 관리들에게 제모와 제복과 패검(佩劍)을 의무화하였다. 모자와 소매에는 금테를 둘렀고, 상의 어깨에는 금테가 달린 견장(肩章)을 달았다. 이 금테의 두께로 직급이 구분되었다. 제복 착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공서의 하급직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제모와 제복, 칼을 차게 한 것은 총독정치가 무단통치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 때 한국인은 사소한 일에서도 비정하게 억압을 당했다. 한 번은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각자 파리통 한 개씩을 비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부모와 아이 등 5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막내 아이가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파리통을 4개만 준비하고 한 개는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병과 순사가 와서 이를 법령위반이라 하여 이들을 벌하였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산골에 모자 거주 가구가 있었는데, 저들은 이들 모자를 부부로 민적(民籍)에 올렸다. 모자가 이 사실에 놀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자 '이미 부부로 되어 있으니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고 했다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리하여 밭 매는 농부들은 호미를 휘두르면서 '어느 때 저 왜놈 제거하기를 잡초 베듯 할꼬' 하였고, 새를 쏘는 아이들은 '어느 때 왜놈을 쏘아 잡을꼬' 하였고, 또 무당과 점쟁이들도 '신이여, 어느 날에 무도한 왜놈들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국인이라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지경에서 이에 항거하는 자결 순국이 줄을 이었다. 김희곤 교수의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2007)에 따르면, 경북에서만도 이만도(李晩燾), 이중언(李中彦), 류도발(柳道發), 권용하(權龍河), 김택진(金澤鎭), 이현섭(李鉉燮), 이명우(李命宇) 부부 등 다수가 목숨을 끊었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그들은 이민족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고, 몸을 조촐하게 하여 저절로 결백함이 밝게 빛난다. 그러니 살아서 대한사람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죽어서 대한의 귀신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다"라 하여, 그들의 순국 정신을 기렸다.
일본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도내의 많은 인사들이 광복단이나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항일조직을 결성했다. 또 일부는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나가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러한 항일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결집되었고,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헌병경찰통치를 포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권영배(계성중 교사)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