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학(Neonatology)은 출생 후 한달 이내(또는 100일 이내)의 갓난아기를 치료하는 소아과의 세부 분야 중 하나다. 드라마 '산부인과'에서 고주원이 맡았던 의사 이상식이 바로 신생아 전문의다. 국내에서 신생아 전문의라는 자격 제도가 생긴 것도 3년밖에 안 됐다. 소아과 전문의를 딴 뒤 2년간 현장 근무를 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받는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생긴 것도 1993년이다. 당시 창립 멤버는 25명에 불과했다. 그 전에는 그저 소아과의 한 분야로만 여겨져 따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구파티마병원 이상길(59) 의무원장은 국내에서 신생아학을 공부한 1세대다. 신생아 치료 분야의 선구자인 셈. 1976년에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80~1983년 파티마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까지 30년을 파티마병원에서 근무했다.
◆꺼져가는 작은 생명 살리고파
아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임신 후 40주 만에 태어나야 정상이다. 26주(6~7개월)에 태어나면 몸무게가 700g 정도밖에 안 되는 초미숙아가 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생존 한계선은 '임신 기간 23주, 체중 500g'.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기에도 못 미치는 극초미숙아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의료기술과 함께 선구자들의 앞선 노력 덕분이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신생아 분야에 이 원장이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파티마병원에 근무할 때만 해도 신생아가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분만이 800건씩 이뤄졌죠. 지금은 출산율 저하 탓에 120건 정도로 줄었지만. 매일 20~3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워낙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적잖은 신생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호흡곤란증. 아직 폐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미숙아들은 숨을 쉬지 못해 세상과 만나자마자 떠나야했다. 1980년대 초반, 신생아실에는 인공호흡기조차 귀했다. 장비가 있어도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랐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였다. 의과대학 시절 신생아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 동료 의사가 아기를 낳았는데 1.8㎏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될 몸무게지만 당시에는 그저 운명에 맡길 수 밖에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두달 입원한 끝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아기는 30대 중반의 가장이 됐습니다."
◆신생아학의 선구자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몸무게가 1.5㎏ 이하만 돼도 힘들던 상황인데, 1988년 우리 병원에서 몸무게 970g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더군요. 운이 좋았던지 그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기적을 이뤘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아기는 지금 건장한 청년이 됐다. 지난해 이 원장에게 찾아와 군 입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자신감을 얻은 사건이지만 동시에 신생아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계기였다. 이름만 '신생아실'일 뿐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했다. "내가 모자라서 미숙아들을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989년 그는 미국 시카고대로 떠났다.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1~1.5㎏ 미숙아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살려내고 있었죠." 이후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특히 미숙아의 경우, 호흡기 치료의 후유증이 컸다. 폐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미숙아에게 강제로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이 사용됐지만 이럴 경우 폐가 상해서 이후 '기관지폐 이형성증'이 생기고 갖자기 폐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고민하던 이 원장은 인공호흡기의 새로운 치료법을 차례대로 접하게 된다.
1분에 600~800회 진동을 줘서 공기를 조금씩 불어넣어 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인 '고빈도 환기요법'도 1990년 처음 학술지를 통해 접하고는 199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생아학회에서 임상사례를 처음 발표했을 때 의사들은 깜짝 놀랐다. 지방 병원이 처음 도입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은 서울 병원들도 잇따라 치료 장비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에 근무하는 대만 출신 왕(Wang) 박사를 찾아가 'nCPAP'(지속적양압공급치료, 흔히 nC팝)을 배워 국내에 알렸다. "처음엔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손가락질했죠." 그가 국내에 돌아와 nC팝을 완전 도입시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지금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nC팝을 도입했다.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의사
그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여전히 미숙아 치료 후 남는 후유증이 문제다. 하지만 그는 신생아 전문의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생명을 살리지 못했을 때 부족함과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신생아 치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
"처음 국내에 신기술을 도입한 뒤 저항이 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에 있었더라면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 병원의 의사가 큰소리 내며 자랑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최초'라고 자랑도 못했죠."
대학 시절, 그는 지도교수에게 신생아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24시간 밤잠도 설쳐가며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데 수명 단축할 일 있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것. 이 때문에 소아과는 최고 인기 분야였지만 신생아 분야는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이 원장과 함께 신생아학을 공부한 1세대 선구자들은 전국에서 10여명에 불과하다.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개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당시 소아과는 최고 인기였습니다. 하루 환자를 300~400명씩 보던 때였죠. 개원의로 남았더라면 지금쯤 수십억원짜리 빌딩 한채는 지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의사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의사,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은 못 해도 눈빛만 보고도 믿어주는 의사.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의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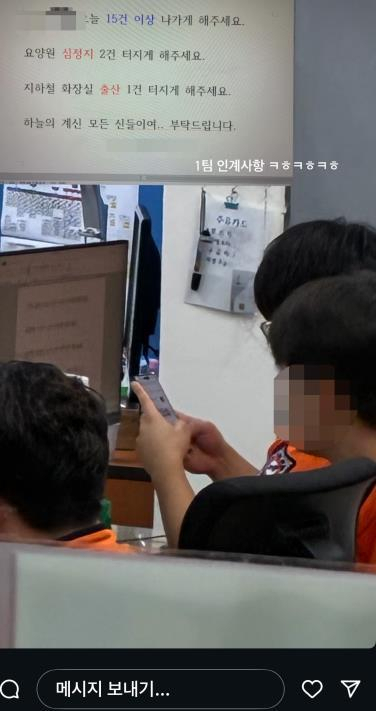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