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3월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첫 만민공동회의 회장은 쌀장수 현덕호였다.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개항으로 신분제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1만여 명의 민중을 대표하는 자리를 상인이 차지한 건 당시로는 파격이었다. 그해 10월에 열린 2차 만민공동회에는 백정(白丁) 박성춘이 개막 연설자로 나섰다. 이들을 앞세운 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던 당시 상황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독립협회의 의도였을 터.
100년도 더 지난 오늘을 짚어보면 사농공상의 서열은 소멸하긴커녕 더욱 득세하고 있다. 기업이 국부를 좌우하는데도, 세계 경제가 금융자본의 힘에 휘청이는데도, 기능 인력이 부족해 공장이 멈추는데도 '상'과 '공'은 여전히 홀대받는다. 식량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치면서 수입에 의존해 농촌을 비워버리는 '농' 무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농공상의 분류를 세운 춘추전국시대에 소수 귀족들이 독점하던 지식과 학문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던 '사'가 아니라 자격과 직업으로서의 '사'자만 대접받는 풍조가 문제의 근원이다.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는 '사'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싸고도는 정치 탓이다.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 파산 변호사가 속출한다거나 의료 장비 리스도 못 갚아 문 닫는 의사가 급증한다지만 한국의 전문 서비스 인력은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07년 현재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변호사 1명당 인구는 5천891명으로 서구의 20배에 이른다. 인구 1천 명당 약사 수는 0.65명으로 OECD 평균인 0.76명에도 못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변호사와 법무사 선발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영리 법인 약국 허용 등 공급자 중심의 전문 자격사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지만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30년 만에 허용한 약대 신설 정원이 고작 350명이고, 그나마 갈라먹기식으로 배정하다 보니 지역 2개 대학이 내년부터 25명 정원으로 약대를 신설,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러니 전문계고 졸업생까지도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 '사'자에 대한 집착이 모질어지는 것이다.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역발상이 아니면 머잖아 국기(國基)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더 이상 귓등으로 흘려선 안 된다.
김재경 특집팀장 kjk@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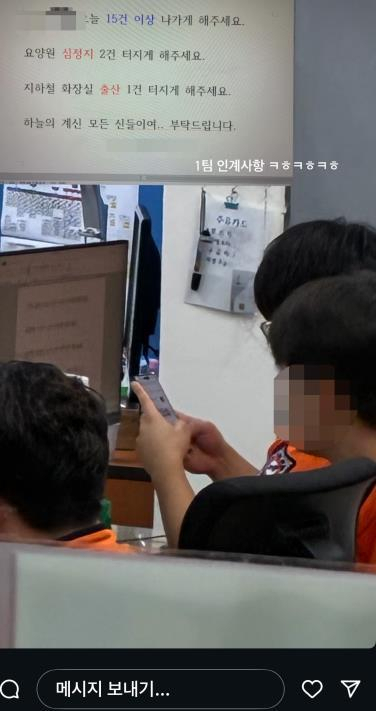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