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식 음악회에 자주 간다. 나는 음악 들으러 갈 때 차려 입고 가는 게 내키지 않는다. 일부러 양복에 넥타이도 풀고 스니커 운동화를 신고 간다. 아무도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을 건데도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옷을 단정히 갖추는 원칙적인 이유가 있긴 하다. 무대 위의 연주자들이 연미복이나 드레스를 입는데 관객들도 기본적인 예의로 답해야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화려하게 입는 걸까.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면 여기저기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조용해진다. 박수를 받으며 지휘자가 등장한다. 서곡이 끝나면 이날의 주인공인 독주자가 나올 차례다. 마치 무대를 처음 밟는 사람인 것처럼 지휘자가 모시러 간다. 수석 바이올린 주자를 비롯한 단원들도 독주자를 정중히 맞이한다. 연주는 시작되고 모두가 음악에 몰입하는데 미리 기침을 해놓고선 또 쿨럭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실례는 교향악의 악장 사이에 멋모르고 치는 박수가 아닐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거슬릴까.
곡 중간에 박수를 금하는 일은 베토벤에서 브람스 시대에 걸쳐 퍼졌다는 설이 있다. 악상의 기승전결 구조를 허물어버린 바그너에 이르러 확실한 규범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유력하다. 여기에 담긴 뜻은 감동도 참아뒀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여주라는 것이다. 클래식과 같은 고급 문화 향유자들이 절제력을 가진 교양인이란 걸 티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박수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 잘 알려진 고전 음악은 괜찮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현대음악에 들어서면 언제 끝나서 박수를 쳐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관습적인 피날레가 유행처럼 퍼져간 낭만주의 시대 곡들조차 그렇다. 이분음표-이분음표-온음표 장단으로 거창하게 처리하는 평범한 예와 달리, 리스트의 어떤 교향시는 선행구를 공백으로 두었다가 이분음 하나를 트럭 경적음처럼 '빰' 찍고는 끝난다. 그것은 청중을 놀라게 하지만 동시에 허탈하게 만든다. 그 당시 부르주아 청중들의 세속적 취미에 대한 리스트의 심술이다.
관객에 대한 반항은 앙코르 요청을 간혹 무시하는 연주자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두 명의 아르투로(Arturo),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A. Toscanini)와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미켈란젤리(A. B. Michelangeli)가 곧잘 그랬던 앙코르 거절은 그것을 연주자의 당연한 의무로 착각하는 청중에 대한 공격이다. 옷차림과 박수와 앙코르, 음악회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전통은 오랜 기간 다듬어져 온 상징의 연속이다. 지금은 생소하고 파격적인 무대 예절도 훗날에 보수적인 예술의 규칙 속으로 끼어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윤규홍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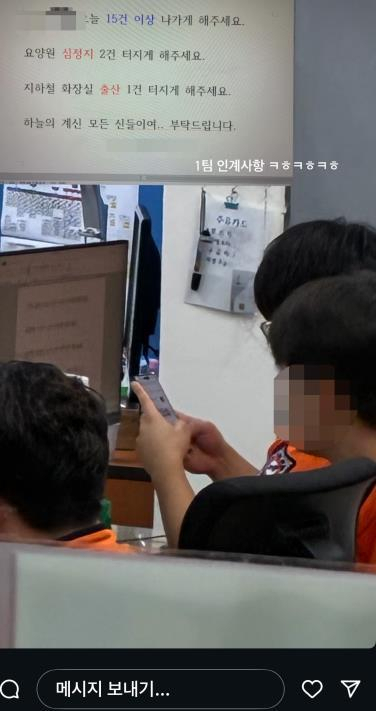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