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임형모(38·대구 서구 평리동) 씨는 골반에 긴 관을 꽂고 있었다. 염증으로 생긴 고름이 빠져나오는 관이었다. 14년 전인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그의 다리에서는 고름이 끊이지 않고 흘렀다. 이불 사이를 비집고 나온 형모 씨의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사고로 입원하기 전 178cm의 키에 몸무게가 68㎏이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10개월 동안 4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고름은 멈추지 않았다. '감염성 근육염'을 앓고 있는 형모 씨는 마를대로 말라버린 다리에서 끊임없이 새나오는 고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고, 그리고 해체된 가정
1996년 10월 30일. 형모 씨는 이날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부딪혔던 차량, 절망을 몰고왔던 그날의 날씨와 어둠까지.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일했던 형모 씨는 야간 근무를 위해 늦은 밤 차를 몰았다.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 형모 씨가 몰던 차는 빗길에 미끄러졌고 맞은 편에서 오던 택배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대구에 있던 어머니 전시복(57) 씨는 아들이 살아있기만 기도했다.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니의 간절함은 헛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형모 씨는 2주만에 눈을 떴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모 씨에게는 아내 이미주(가명·36) 씨와 한 살된 아들이 있었다. 장애를 극복하려 했던 형모 씨는 한나절 이상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보냈다. 아내도 옆에서 힘을 보탰다. 혼자 할 수 없는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불행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물리치료를 위해 한살배기 아들을 혼자 병실에 남겨둔 게 화를 불렀다. 물리치료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와 품에 안은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도가 막혀버린 것이었다. 태어난 지 100일을 갓 넘긴 아들이었다.
아들을 떠나 보낸 뒤 아내는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형모 씨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내를 위로해주지도, 품어주지도 못했다. 형모 씨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6개월째 되던 어느날. 묵묵히 간호를 했던 아내가 사라졌다.
◆염증과의 싸움
아내가 떠난 뒤 형모 씨는 어머니가 있는 대구에 왔다. 가정이 해체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다시 어머니의 손에 의지해야만 했다. 위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전 1년여를 병수발해왔던 어머니 전 씨는 아들까지 수발해야했다. 벌써 13년째다.
전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 주방일을 해 월 70만원을 받는다. 힘든 일상이지만 전 씨는 늘 감사의 기도를 한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형모 씨는 병원 신세를 거부했다. 병실에 누워만 있어도 쌓여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지긋지긋했고 무서웠다. 병원비로 사용한 카드 빚만 2천만원이 넘는다. 어머니가 식당일을 해 벌어오는 돈이 병원비로 모조리 들어가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올해 초 열이 심해지고 음식을 삼키면 다 게워낼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 지난 3월 찾아간 병원에서 "감염성 근육염 때문에 하반신에 염증이 퍼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형모 씨의 병원 생활도 시작됐다. 여름이 되면 병원을 나설 수 있을줄 알았건만, 그는 2010년의 사계절을 모두 병원에서 맞이했고 또 보냈다.
염증을 빼내는 수술만 4차례, 골반을 감싼 붕대 사이에서는 계속 염증이 흘러나온다. 그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봉합 부위가 터질까봐 걱정돼서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등에 욕창이 생겼다.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버린지 오래다. "물리치료사 한 분이 휠체어 생활을 권유하더라구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걷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제 걸을 수 있을 것이란 비현실적인 꿈은 꾸지 않아요." 그는 침대 앞에 놓여있는 휠체어를 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됐다.
◆장애를 이긴 희망
정을 둘 곳이 필요했던 형모 씨는 6인실 병실을 거쳐가는 환자들과 마음을 나눴다. 다른 환자들은 형모 씨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꿋꿋이 견뎌내는 형모 씨는 병실의 희망이었다. 양쪽 다리가 절단된 40대 남성, 관절이 빠져셔 입원한 사람, 팔 뼈가 부서진 환자 등 그들이 오히려 형모 씨를 위로했다. 병실을 잠시 거쳐간 이들이 건넨 위로가 희망의 불씨가 됐다.
형모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벽에 붙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기억한다. '29일은 고름을 빼는 수술을 하는 날, 이 고름이 멈추는 날 나는 병실을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모 씨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격증 책이 놓여 있었다. 노트북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책을 보면서 매일 머릿속으로 연습을 한다. "장애를 안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울함은 어두웠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형모 씨는 자신을 감싼 우울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 이웃사랑 계좌는 '069-05-024143-008(대구은행), 700039-02-532604(우체국) ㈜매일신문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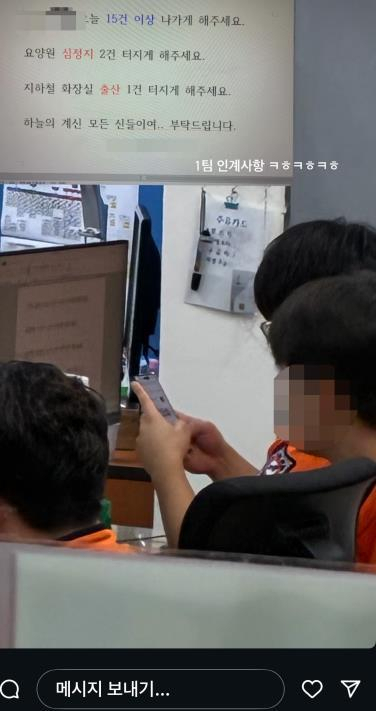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