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은 1861년 창립 이래 공학, 이학, 건축학 분야에서 수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유능한 과학자들을 배출해 낸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다. MIT는 이름만 보면 공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사무엘슨이 이 대학 교수를 지냈다. 정치학 언어학 심리학 같은 인문사회과학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MIT에 뒤처지지 않는 캘리포니아공과대학(CIT'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IT는 캘텍(Cal Tech)으로 즐겨 불리는데 역시 인문학의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인문학 교수 수가 이공계의 5배나 된다고 한다.
서구의 기술과학 중심 대학들이 현재의 명성을 일구게 된 것이 인문사회과학과의 공존을 통한 질 향상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내 대학들도 앞다퉈 인문학 비중 늘리기를 하고 있다. KAIST는 문화과학대학(문화기술대학원'인문사회과학과 등)을 행정 기능이 집약될 세종시로 옮겨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과 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 공학을 융합한 전문 석'박사 대학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광주나 울산과학기술대도 이런 시도들을 앞다퉈 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포스텍(포항공대)이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하고 나섰다. 한국 인문학의 거두들을 대학으로 불러들인 것.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인문학부 강화가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강신표 전 한국문화인류학회장, '미'(美)의 순례자인 강우방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내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성복 계명대교수,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박이문 포스텍 명예교수, 국내에서 가장 인문학적인 물리학자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등 5명. 이들은 포스텍의 젊은 이공학도들에게 통섭(通攝'학문대통합)의 길을 가르친다.
포스텍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학과도 없었고 커리큘럼도 부족했다. 전공 학문만 가르친다고 뛰어난 과학자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이공학에 인문학을 접목하는 이번 포스텍의 시도가 한국 과학계의 비약적 발전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
최정암 동부지역본부장 jeongam@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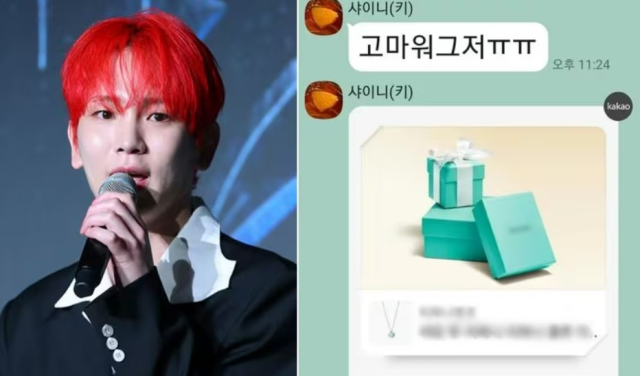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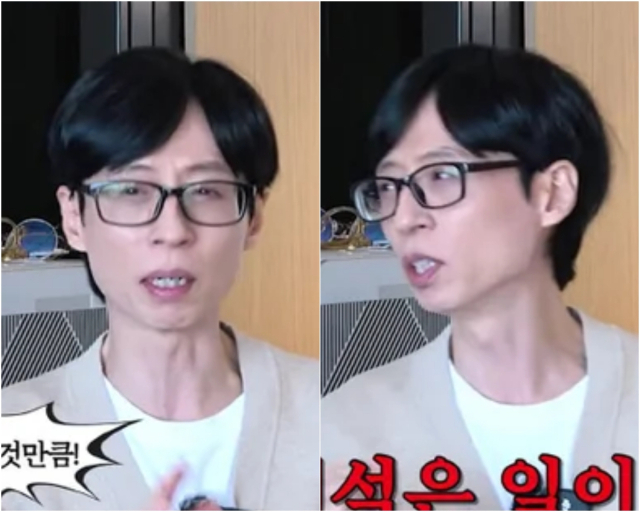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