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은 엄마의 희망이었다. 일찍이 남편과 이혼하고 장남마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감영자(63'여) 씨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 전종호(35'뇌병변 장애 1급)뿐이었다. 그랬던 희망이 무너졌다. 3년 전 종호 씨가 쓰러지면서 엄마는 주저앉았다. 듬직했던 아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됐고 감 씨는 24시간 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엄마의 꿈이 무너졌다
15일 오후 대구 대학병원 3층 신장센터. 종호 씨가 혈액투석을 받을 차례다. 간호사가 오른쪽 팔에 주삿바늘을 넣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변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종호 씨의 손을 어머니 감 씨가 꼭 붙잡았다. "종호야 괘안타. 엄마 여기 있다 아이가."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루한 싸움이다. 종호 씨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을 찾아 4시간에 걸쳐 혈액 투석을 받는다. 당뇨합병증으로 약해진 그의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병변 장애까지 왔다. 키 183㎝의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오는 것은 감 씨의 몫이다.
종호 씨는 어릴 때부터 당뇨 때문에 힘들어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감 씨는 종호 씨의 건강을 걱정했다. "소아 당뇨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의사의 말을 여러 번 들은 때문이었다. 병 때문에 시력이 약해져 종호 씨는 눈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았다. 그래도 아들은 잘 해냈다. 지역 사립대 건축학과에 입학했고 졸업장까지 땄다.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될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 만성 질병이 있고 수시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는 탄탄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건설 노동일이었다. 감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몸이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가을 결국 탈이 났다. 감 씨가 볼일을 보러 잠깐 밖에 나간 사이 동네 사람에게서 "종호가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다. 의식을 잃은 아들은 말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감 씨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몇 달이 지나 아들이 깨어났다. 그때부터 종호 씨는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
◆끊지 못한 가난의 고리
감 씨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억척 엄마였다. 종호 씨가 5살 때 남편과 갈라섰고 그때부터 생계를 혼자 책임졌다. 당시 경남 진해에서 살았던 감 씨는 두 아들을 집에 두고 떡을 팔러 거리로 향했다. 머리에 고무대야를 이고 하루종일 거리를 떠돌면 세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겨우 벌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세 식구는 친척이 사는 대구로 올라왔다. 사람 많은 대도시에 오면 먹고사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대구에서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감 씨는 틈틈이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은행 앞에서 떡을 팔며 돈을 벌었다. 떡을 팔아서 번 돈은 허투루 쓰지 않았다. 훗날 두 아들이 대학에 가면 첫 등록금으로 내기 위해서였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감 씨는 종호 씨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았다. 아들의 당뇨가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껴져서다. "나도 29살 때 당뇨가 와서 고생했는데, 종호가 한 번씩 '엄마 때문이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반찬을 숟가락 위에 얹어줄 때도, 옷을 샀을 때도 형보다 종호 씨가 먼저였다. 엄마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아서였을까. 종호 씨보다 세 살 많은 형은 고등학교 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종호 씨가 쓰러지기 전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마라"며 한 번씩 전화가 오곤 했지만 이제 그 전화마저 끊겼다. "이게 다 나 때문이지, 내가 못난 엄마지." 감 씨가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픈 엄마 그리고 아들
현재 감 씨의 몸도 성치 못하다. 오랜 당뇨로 고생하다가 10년 전 하지마비 증세가 와 떡파는 일도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 아들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축나고 있다. 감 씨는 아들 몸에 욕창에 생길까 봐 매일 밤 수시로 일어나 몸을 뒤집고, 대소변을 볼 때마다 기저귀를 간다. 종호 씨가 쓰러진 뒤 맘 편히 잔 적이 없다. 최근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나와 병원에 가니 "콩팥이 나빠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만약에 감 씨마저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감 씨는 지난달 은행을 찾아 25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생계급여 50여만원과 아들의 장애연금 15만원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 택시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할 뻔한 상황도 있었다.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소. 내 아들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지금 감 씨는 마음을 비웠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도, 이 모든 병이 사라졌으면 하는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고 뒤 말을 하지 못하는 종호 씨가 '엄마'라고 따뜻하게 한번 불러줬으면,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이웃사랑 계좌는 '069-05-024143-008(대구은행), 700039-02-532604(우체국) ㈜매일신문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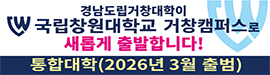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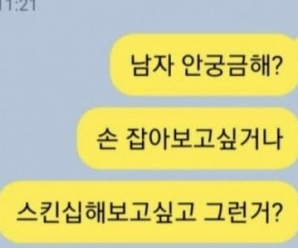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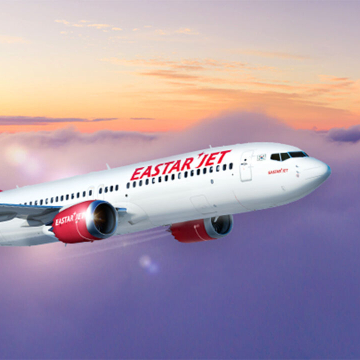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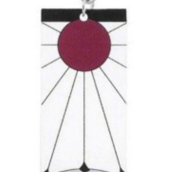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