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 말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우는 사람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우는 사람이다.' 이 말은 게오르규가 '25시'에서 말한 대로 시인은 '잠수함의 토끼'처럼 세계의 부조리함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며, 또한 힘없는 것들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끝까지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물론 그 매개는 시(詩)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늘 부끄럽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처럼 스스로 '나는 시인'이라 맹세코 내뱉은 적은 없으나, 누가 '시인'이라 부르거나 지칭할 때 암묵적인 동의를 했으니 나의 이 부끄러움은 지극히 타당할 터. 이 얼굴 붉어짐을 '저는 아주 질 낮은 삼류시인이에요'라는 말로 늘 얼버무리긴 하지만, 이 또한 여러 의미에서 온몸을 스멀거리게 하는 말 아닌가.
한번은 진지하게 내가 왜 '시인'이라 불리는 것에 본질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곧 수도 없이 내면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가장 큰 것은 시심(詩心)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 한 편 쓰지 못했다는 자괴감이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타자의 고통을 절절하게 감지한 적이 있었던가. 감지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한 적은 있었던가. 끝까지 그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운 적이 있었던가 하는 반성도 뒤따랐다. 없었다.
그뿐 아니었다. 시를 매개로 하여 위악(僞惡)과 위선(僞善)을 행한 적은 없는가. 강한 자의 비열함과 약한 이가 당하는 굴욕을 그냥 보아 넘긴 적은 없는가. 자신의 이익과 안일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적은 없는가. 있었다. 아아, 참으로 질 낮은 감상적인 고백이지만 수도 없이 많았다. 쓸데없고 단단한 아집에 사로잡혀 양날의 칼을 휘두르며 입힌 상처들까지, 생각해 보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퍼부은 저주까지 합하면 내가 입은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 '박 시인' 하고 부르면 나는 뜨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검열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질책하고 그것 또한 위선 아니냐, 누가 또 지탄을 해도 나는 나를 '시인'이라 부르는 것에 속으로 숭숭 두드러기가 돋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누가 '박 시인' 하고 부르면 제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딴청을 부리고 싶은 것이다.
박미영(시인·작가콜로퀴엄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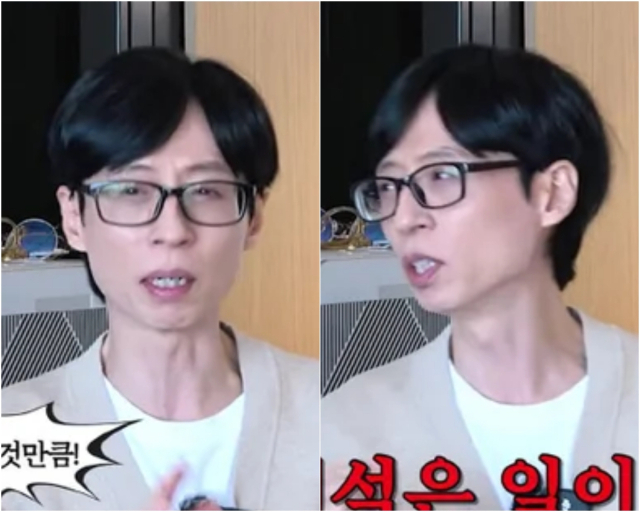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