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을 보다가 길 한쪽에 꽃 화분 몇 개를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눈이 갔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바람이 찬데 꽃잎이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다. 절기란 이렇게 무서운 건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꽃은 피게 되어 있다. 복잡한 시장 한구석에서도 꽃은 기어이 꽃이 되고자 자기 몸을 뚫고 나와, 세상을 향해 깃발을 흔들고 있다.
꽃을 보니 가수 정훈희의 '꽃밭에서'가 생각난다. 가요는 형식과 가사, 내용이 얇아서 새로운 가수가 나와 다른 느낌으로 부르면 원곡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꽃밭에서'는 정훈희를 능가할 가수가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는 그녀만의 꽃이요, 꽃잎이다.
요즘 들어 부쩍 유행가가 좋아지는 것은 계절 탓일 수도 있고, 나이 탓일 수도 있겠다. 꽃이 피면 꽃만 보이고 잎은 안 보이던 시절, 한때는 클래식을 고집했던 적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우선하고,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웠던 젊은 날이다. 어느 일요일 늦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스무 살 아들 방에서 나직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곡이 흐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제 꽃보다 잎에 눈이 가는 나이가 되어 유행가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어느 봄비 오는 날 카페에서 '빗속의 여인'을 색소폰으로 기가 막히게 부는 연주자가 있어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제 모습이 마뜩찮았는지, 자기도 옛날에 색소폰을 조금 불었었다고 털어놓았다. 순간 정색하여 '무슨 말씀이냐'고 했다.
색소폰은 늙고 초라하고 못생긴 남자가 불어야 깊은 슬픔이 느껴지고 호소력이 짙다고 해명을 덧붙였더니, 그 사람이 '그럼 저는 젊고 넉넉하고 잘생겼다'는 뜻이냐고 헷갈려 해서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 모시고 뉴질랜드에 갔을 때 호텔 바에서 칠순은 넘었음 직한 늙은 남자가 색소폰으로 'My Way'를 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다. 저는 그때, 20달러를 선뜻 꺼내 연주자에게 팁(Tip)으로 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청소를 하다가 걸레를 든 채 TV 화면에 눈이 꽂힌다. 소리꾼 장사익이 걸쭉하게 '봄날은 간다'를 부르고 있다. 오래된 노래 '봄날은 간다'에서는 백설희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가 압권이지만, 장사익은 추레한 모습으로 얼굴을 구기면서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고 내지르니 가슴이 시리다. 누가 유행가를 나무라는가. 우리 인생이 바로 유행가가 아니던가. 그대도 나도 지금 풀잎이 되어 흘러가고 있다. 유행가처럼.
小珍/에세이 아카데미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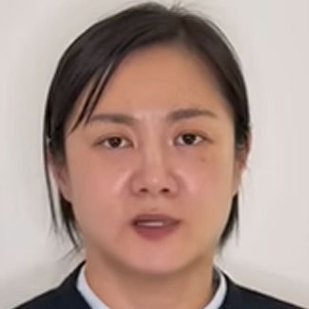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