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순(대구 북구 동천동)
일요일 오후 한동네에 사는 친한 동생이랑 함지산에 올랐다. 동생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니 금방 정상에 다다랐다. 정상에서 조금 쉬다가 약수터가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약수로 목을 축이고 한숨을 돌리는데 느닷없이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을 나설 땐 날씨가 좋아서 우산도 없이 그냥 왔는데 큰일이다. 간간이 내리는 빗방울이 거세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소나기로 변했다. 거센 돌풍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나기의 위력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삽시간에 벌어진 예측불허의 공포 앞에 우리 둘은 나무 밑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굵은 빗줄기와 번개를 동반한 천둥으로 나무 밑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옷은 이미 다 젖었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 산 아래로 달음질치듯 뛰었다. 눈앞에 정자가 보였다. 소나기를 피해 정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 정자 안은 초만원이었다. 산을 오를 때 무더위는 간 곳 없고 이젠 비에 젖어 추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으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정녕 우리네 삶이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는 듯해서 정자를 빠져나왔다. 차츰차츰 비의 강도가 약해져 운암지에 내려오니 언제 비가 왔나 싶게 햇살이 비쳤다. 네거리 건널목에서 낯익은 중년 아저씨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이다.
우리 둘을 보더니 평소 잘 웃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껄껄 웃는다. 남편의 웃는 모습에 우리 둘도 같이 따라 웃었다. 유비무환을 생활신조처럼 지키는 남편의 손에 하늘색 우산 하나가 쥐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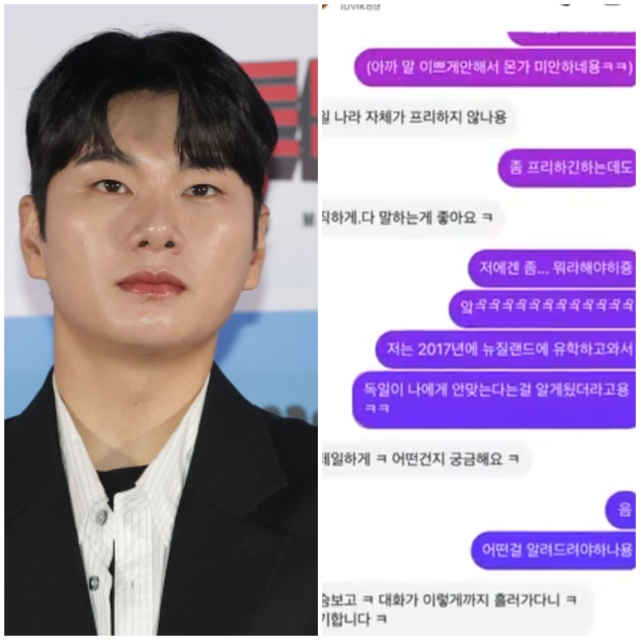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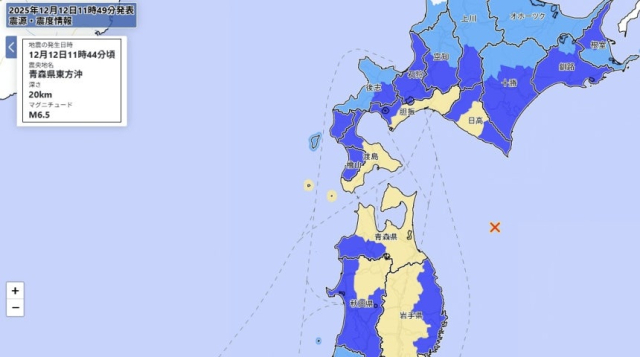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