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에서 매년 열리는 '삼국유사 골든벨' 대회와 인연이 있어서 올해도 지난 9일 가족들과 구경을 갔었다. 결승에 올라온 두 학생은 열 문제 이상 같이 맞히고, 같이 틀리면서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쳤다. 문제들 가운데는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문제는 이렇다.
"신문왕대의 명망 높은 스님이었던 경흥 법사가 갑자기 병이 나서 한 달 이상 누워 있게 되었을 때 한 비구니가 나타나서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비구니가 알려준 치료법은 현대 의학에서는 면역 글로블린을 증가시켜 면역계를 강화하고, 엔돌핀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웃음'이었는데, 틀린 학생들은 답을 듣고는 짧은 탄식과 함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참가한 학생들이 대부분 역사에 관심이 많은 문과생들이다 보니 '비구니가 알려 준 치료법'에서 답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면역 글로블린, 신경전달물질, 코티졸'과 같은 말이 나오자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해 버린 것이다. 가야에서 철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가야에서는 원자 번호는 26번이고 주기율표상에서 8족 4주기에 속하는 이 금속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어려워한다.
이것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개념어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의 배경지식을 이용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지고 낯선 개념어가 연이어 나오면 이해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대로 문과생도 과학에 대한 약간의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까지 수능에 나온 과학 지문들을 읽어 본 사람들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하는 '코스모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정도전'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다.
모의고사 문제 출제나 EBS 교재를 만드는 작업에서 나는 늘 비문학 독서 부분을 맡기 때문에 과학, 철학, 미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 여러 분야의 글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문과 출신이지만 과학 분야의 글이 쉽고, 오히려 인문학 분야 교수들이 쓴 논문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주제로 삼는 대상이 구체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이 많다. 게다가 문장은 엄청나게 길어서 영어 독해하듯 끊어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글들도 많다. 인문학은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쉬운 원리를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문과 사람들은 문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쓰기에서부터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능인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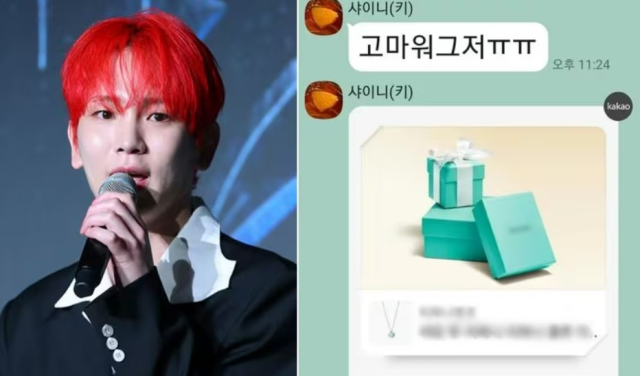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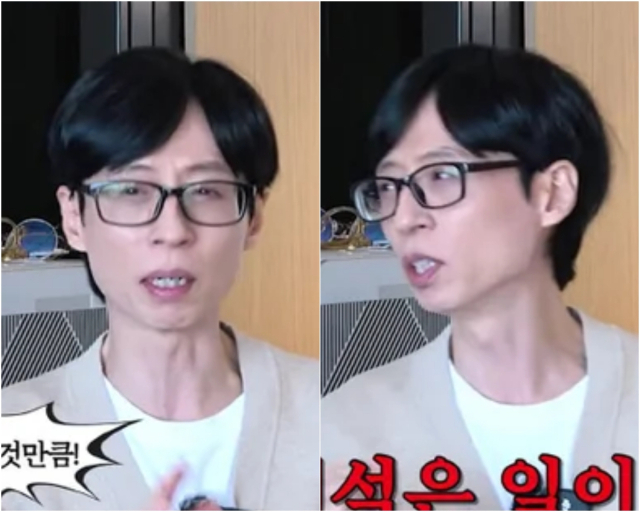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