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 박현기의 회고전이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에 다녀왔다. 전시는 놀라웠다. 그 중심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방사형 구조물로 제작된 작가 아카이브가 있었다. 한 작가가 30여 년간 활동해 온 영상, 사진, 책자들을 그토록 방대한 아카이브로 구축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활동 기간임에도 그 많은 양의 작업을 추구해 온 작가의 열정이 더 놀라웠다.
이를 축으로 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비디오 작품들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부터 그는 줄곧 비디오라는 매체를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었다. 백남준이 파격적인 비디오 아트를 통해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는 동안 그는 이와 다른 방식의 동양적 사유를 통해 국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전시명이기도 한 '만다라' 시리즈를 비롯하여 돌, 철판, 목재 그리고 물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들과 거대한 그의 아카이브를 보고 있노라니 그간 그가 추구해온 작업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00년 1월 갑작스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국내는 물론 일본, 유럽 등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 열린 대구현대미술제를 통해서였다. 194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 직후 대구에 정착했고 이후 홍익대에서 회화와 건축을 공부하고 대구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인테리어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작품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그가 최병소, 이강소 등의 당시 젊은 작가들과 함께 대구현대미술제를 주도하며 대구의 미술을 이끌어 간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인다.
2008년 그의 사후 첫 유작전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현재 2만여 점에 이른다는 관련 자료들이 처음으로 정리되어 공개된 것도 이때였다. 비디오 아트의 특성상 유작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의 수집이나 정리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당시 전시 자료들은 고스란히 보관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회고전이 이들 자료로부터 기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이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점이다. 박현기라는 작가가 지닌 중요성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이는 이상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그의 자료들이 활동 기반이었던 대구에서 가장 먼저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어딘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유명 작가들을 초청하는 일이 일반화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불현듯 그의 자료들이 대구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되는 이유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돌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마치 대구에서 과천으로 옮겨 간 자료들의 무게 같기도 했다.
이승욱 대구문화 취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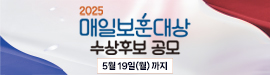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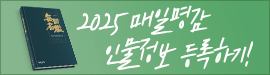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