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붉은 벽돌담을 배경으로
흰 비닐봉지 하나,
자늑자늑 바람을 껴안고 나부낀다.
바람은 두어평 담 밑에 서성이며 비닐봉지를 떠받친다.
저 말없는 바람은 나도 아는 바람이다.
산벚나무 꽃잎들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던 때, 눈물 젖은 내 뺨을 서늘히 어루만지던 그 바람이다.
병원 주차장에 쪼그리고 앉아 통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속수무책 깍지 낀 내 손가락들을 가만히 쓰다듬어주던 그 바람이다.
(……)
(『먼 우레처럼 다시 올 것이다』. 창비. 2013)
자늑자늑한 바람이란 가볍고 부드러우며 차분한 바람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따뜻한 봄날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그 바람이기도 하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고통으로 참담해질 때 바람은 나를 쓰다듬으며 어루만져 준다. 우리는 그 바람이 익숙하다. 내가 홀로일 때 언제나 내 곁을 지키는 바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늘 반복해서 기도하던 그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바람. 그 바람은 나를 허공으로 떠받친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바람을 껴안고 나부낀다고 생각한다. '제 몸 비워버린 비닐봉지'는 바람을 가슴에 품고 '적요한 독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닐봉지를 떠받치는 것은 바람. 두 번째 연의 '바람은……떠받친다'가 없어도 시는 살아나고 덜 불편했을 텐데 시인은 왜 굳이 이 서술을 끼워 넣었을까?
'나도 아는 바람'은 모두의 바람이다. 모두에게서 오는 바람이고 모두에게로 가는 바람이다. 나는 우리의 나이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관계체성이라고 불렀다. 시인이 눈물 흘리고 쪼그려 앉아 고통스러워할 때 낯익은 바람이 자늑자늑 위로해 주듯이 이 삶도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적요한 독무'는 나도 아는 모두의 바람을 마음을 비우고 팽팽하게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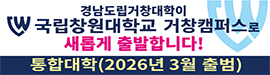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