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셔츠랑 넥타이 손수건 등을 챙겨준다. 회의가 많은 월요일에는 수수하고 점잖은 색,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에는 화려한 색 등으로 나름대로 그날 스케줄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 번도 남편은 스스로 챙겨 입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남편의 옷을 새 옷으로 바꾸는데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다. 책상 열쇠 같기도 하면서 방문 열쇠 같기도 한 낡은 열쇠였다. 버려야 할 것을 적당히 버릴 데를 찾지 못해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줄 알고 내가 버려 줄 요량으로 화장대 위로 휙 던졌더니 남편이 정색하며 얼른 챙겨 넣었다.
문제의 열쇠는 시골집 어머님 방문 열쇠라는 것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십여 년이 다 되었는데 왜 그 열쇠를 매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옷이 상할 수도 있다고 버리라니까 남편은 갑자기 시골집에 갈 일이 있을 때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집은 폐허가 되어 마당에는 잡풀이 수북하고 낡은 처마 끝에서는 빗물에 씻긴 황토 흙이 부스럭부스럭 떨어지고 있다. 중간 중간 시멘트에 싸인 서까래는 부식되어 벌레가 집을 지었고 아래채는 저절로 반쯤 무너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 방문 열쇠를 버리지 못하고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고이 챙기곤 한다.
지난 추석 무렵의 일이다. 서울에 계신 아주버님이 설, 추석에는 빈집이지만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고향에 와서 제사를 모시겠다고 했다. 사람의 온기가 끊긴 집은 금방 허물어져 폐가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본인들의 집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결국 남의 집 수돗물을 퍼다 나르면서까지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빈집에서 제사를 모셨던 것이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며칠 전에 다녀간 듯이 그렇게 추석의 1박 2일을 보냈다. 그때를 생각하면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열쇠에 대한 남편의 집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아주버님은 비록 폐가이지만 고향의 낡은 뜨락에서 어머님을 찾은 것일 게고 그 동생인 남편은 엄마의 방문 열쇠에서 어머님의 체취를 찾은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도 살지 않는 다 허물어진 그 집에서는 누가 소식 올 리가 만무하고, 어머님이 살지 않는 집은 집의 형태를 갖추었을지언정 더 이상 집이 아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갑자기 시골집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열쇠를 챙긴다는 것이다. 유품이 떠올랐다. 열쇠는 어머님의 유품인지도 모른다.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였지만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귀중한 열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런 신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린다면 하루는 얼마나 행복할까. 십 년 가까이 버리지 못한 한낱 납덩이가 행운의 열쇠일 수도 있다. 남편은 어머님이 주신 행운의 열쇠인양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랬다. 몇 달 전에 세탁물을 맡길 때 미처 빼놓지 못해 열쇠를 잃었다. 그때 남편은 직접 세탁소까지 가서 찾아온 열쇠이지 않던가? 분명 남편에게는 행운의 열쇠임이 확실하다. 어머님이 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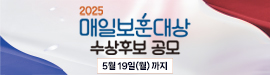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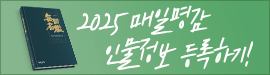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