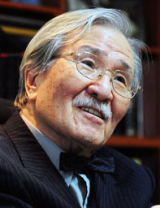
英 의회가 다뤄야 할 'EU 탈퇴' 문제
캐머런 총리 무모하게 투표에 부쳐
의회민주주의 금자탑에 먹칠한 셈
브렉시트 결판은 시대착오적 망상
지난 23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로 영국은 드디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탈퇴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52%나 되는 반면 잔류를 찬성한 유권자는 겨우 48%밖에 되지 않았다. 표차가 130만 표나 되기 때문에 근소한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대 50이 될 수 있었는데 2%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대세를 결정한 것이다.
4개월 전에 선포된 캐머런 총리의 국민투표 실시에 관련된 기사나 발언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민주주의도 이젠 기진맥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 아니라 찬란한 영국의 민주적 금자탑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EU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면 모르지만 '탈퇴'는 이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된 28개국 모두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과제인데 영국의 탈퇴로 EU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책임을 영국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해방을 계기로 대학교육을 받게 된 우리 세대는 일부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압도되어 소련과 러시아를 흠모했지만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 젊은이들은 미국과 영국을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고 우리들의 꿈은 의회민주주의 원조인 영국을 본받는 일이었다. 대학시절에도 희망은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유학 가는 것이었다.
영국이 없었으면 의회민주주의가 유럽과 미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영국에 봉건 제후들이 일방적으로 왕이 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대들어 존 왕이 하는 수 없이 그 문서 '대헌장'에 서명한 것이 1215년이었으니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 나라에는 국왕 찰스 1세의 전제주의에 항거하여 의회가 1628년 '권리의 청원'으로 왕을 굴복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한 민주국가인가.
청교도 혁명에서 의회파의 군대를 이끌고 왕당파를 무찔러 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을 수립했던 올리버 크롬웰은 우리 눈에는 '영웅'이었다. 그러나 오늘 디스레일리, 글레드스톤, 처칠 같은 거인들은 영국의 정치 무대에 보이지 않고 토니 블레어나 캐머런 같은 소인들의 모습만 보이는 처량한 영국의 의회정치가 원망스럽게도 느껴진다. 영국 의회가 마땅히 다루었어야 할 'EU 탈퇴' 문제가 역사의식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의 논쟁과 의결을 통해 결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고약한 정치꾼들과 이렇다 할 정견은 없고 다만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저소득층이 52%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울분을 국민투표로 발산하고 승리하여 축배를 들게 된 영국의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영국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공장에도 가고 목장에도 가고 탄광에도 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탈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지도층이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묘안이 있을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당장은 없다. EU 탈퇴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 아마도 영국의 '고독한 영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 경제는 미국에 예속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탈퇴'로 결판이 났을 때 '탈퇴' 운동에 선봉장이었던 나이젤 파라지가 흥분한 어조로, "이것은 민중의 승리(Victory of the People)"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아무리 난민 문제가 골치 아프고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하여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 EU 편에 남아서 EU를 돕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옳은 것 아니었는가? 런던 시장을 지냈고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 탈퇴의 타당성을 강조한 보리스 존스의 모습이 왜 저렇게 초라하게 보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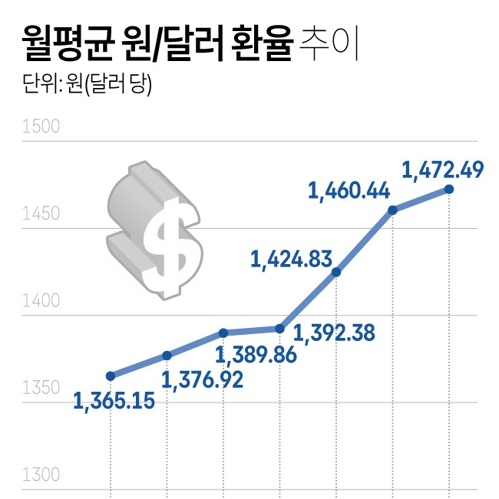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