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물녘 나는 낙동강에 나가/ 보았다. 흰 옷자락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 오래 정든 하늘과 물소리도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강은/ 눈앞에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이마 위로도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느 날의 신열(身熱)처럼 뜨겁게, -안도현, '낙동강'(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중 일부-
"내 시의 강과 관련된 모든 상상력은 내성천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내성천의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한 마리 어린 물고기였다."
여기, 유년의 기억을 좇아 '마음의 안식처'로 거슬러 오르는 이가 있다. 자신의 작품,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에서처럼 예천 내성천으로 향하는 안도현이다.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낙동강' 역시 내성천의 저녁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유년시절 그의 집,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소망실마을에서 본 내성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안식처로 꼽은 곳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버스에서 내려 고평교에서 마을로 가는 2㎞ 남짓의 길. 초등학생 아이에게 2㎞ 흙길은 꽤나 길었다. 이 길은 본디 내성천과 마을을 나누는 둑이었다. 내성천과 마을은 둑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달리듯 이어졌다. 둑은 도로가 된 지 오래다. 둑은 아스팔트 포장을 입고 '강변로'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곳을 걸으면 안도현은 8살 꼬마가 된다. 아스팔트 깔린 강변로는 맨땅 둑길로 바뀐다. 목화밭을 지나쳐 땅콩이 알을 채우는 밭에서는 향긋한 풀내가 올라온다. 내성천은 금모래, 은모래사장으로 펼쳐진다.
내성천은 안도현뿐 아니라 예천군민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떠올리는 대표적 공간이다. 내성천에서 물놀이하고 물고기를 몰던 기억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토닥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성천은 사위어가고 있다. 예천읍내로 향하는 5번 국도의 고평대교와 가까운 소망실마을 앞 내성천은 풀이 한껏 자라 있는 그저 그런 하천변이다. 금모래, 은모래는커녕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바싹 마른 초목이 한가득이다. 주민들은 "진흙이 얼마나 쌓이는지 여름에는 초목이 내성천을 가려 수북하다"고 했다.
내성천의 변화는 비단 이곳만이 아니었다. 내성천의 오랜 벗인 회룡포, 국가 명승지인 이곳에도 모래가 있던 자리에 초목이 자라고 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영주댐을 정조준했다. 안도현의 '내 마음의 안식처'는 유년의 기억으로만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추억도 사라지고 있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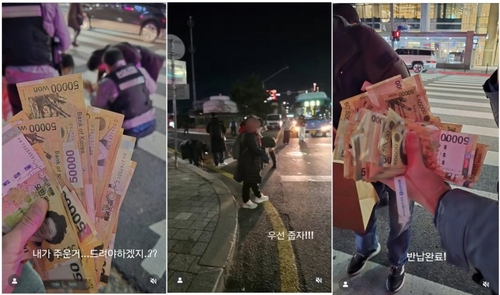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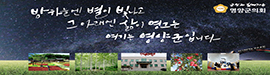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
TK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동력 급상실 '與 내란몰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조계 "삼권분립 붕괴"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